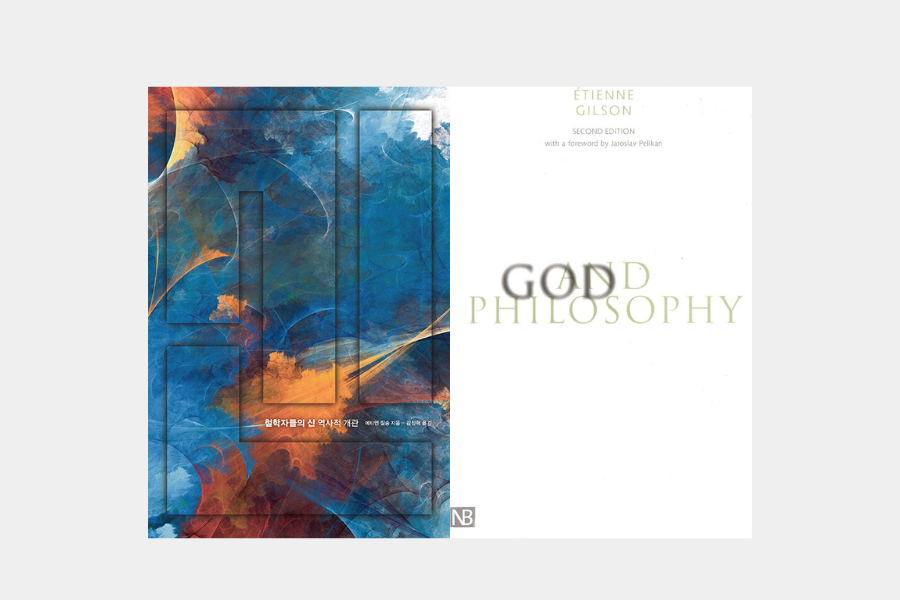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ε. Gilson, God & Philosophy」를 듣고 정리한다.
2024.05.05 ε. Gilson(8), God & Philosophy, Ch. 1
에티엔 질송, ⟪철학자들의 신 - 역사적 개관⟫(God and Philosophy, 2002)
텍스트: https://buymeacoffee.com/booklistalk/god-philosophy-ch-1
에티엔 질송의 《God & Philosophy》 preface까지 읽었고, 이제 챕터 1 신과 헬라스 철학, God and Greek Philosophy 부분을 본격적으로 읽어보겠다. 먼저 제1장의 내용을 소개하기 앞서서 제1장에 치명적인 어떤 오류는 아닌데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숫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책 30페이지의 각주 1번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1권 8, 988b 20-27로 되어있는데, 1권 3, 983b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원서를 보니 영문 폰트가 3자하고 8자하고 혼동된다. 그러니까 꼭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8자가 나온 부분은 3자일 가능성을 좀 보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챕터 1에서 오늘 읽어야 되는 부분에서 보면 각주 8번에 호메로스 《일리아스》의 영역본이 페이지 857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357, 그다음에 862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362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각주 9번을 보면 《일리아스》 5권 889-842행은 339행에서 342행이다. 그리고 각주 10번도 《일리아스》 14권에 288행은 233행이고, 각주 15번을 보면 《형이상학》 1권 8, 988b, 18 - 984a, 2는 1권 3, 983b이다. 우선 오늘 설명할 부분에서는 그걸 고쳐야 될 것 같다. 치명적인 건 아닌데 심하게 실수했다. 이 책의 그런 오류가 이 번역본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다.
1장 God and Greek Philosophy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선 탈레스의 얘기부터 나오는데, 탈레스를 비롯한 자연 철학자들과 헤시오도스가 나온다. 그런 다음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부분이다. 플라톤 이전 철학자들인 자연철학자들하고 헤시오도스, 비중에 비해서 자연 철학자들을 다룬 부분에 비해서 헤시오도스는 간단하게 아주 각주로 처리해 버렸다. 그게 조금 아쉽다. 오히려 저는 형이상학에 관한 텍스트니까 헤시오도스를 좀 더 부각시켜서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를 좀 분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분석과 탈레스의 분석이 분량이 꽤 되는데, 《일리아스》보다는 오히려 《신들의 계보》를 좀 자세하게 좀 다뤘으면 했는데, 각주 17번에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말았다. 이 얘기는 각주로 가야 될 게 아니라 본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왜 이것을 아쉽게 생각하는가 하면 《철학 고전 강의》를 하면서 《신들의 계보》부터 시작을 했다. 《신들의 계보》는 사실 형이상학에서 그렇게 다루어진 텍스트가 아니다. 그런데 《신들의 계보》를 형이상학에 관한 체계에서 집어넣는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자연 철학적 설명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자연 철학으로부터는 형이상학을 도출해낼 수 없지만 종교적인 설명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화가 철학으로 이성적으로 전개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건 다시 얘기를 하겠다.
먼저 탈레스의 얘기가 있다. 탈레스 얘기라고 하는 것은 자연 철학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강연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단초가 될 만한 것들을 꺼내놓고 그다음에 그 얘기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의 귀결, 간단히 말하면 뒷부분에 결론이 있는 미괄식으로 쓴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를 궁금해하면서 읽어봐야 되겠다. 크게 보면 탈레스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최초로 철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오직 진료의 형태를 가진 것들만이 모든 것의 원리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형이상학》 1.3, 983b8에 있는 문장 하나와 그다음에 "철학의 시조 탈레스는 물이 그런 원리라고 천명했다."(《형이상학》 1.3, 983b20)은 한 묶음이다. 물 그러니까 질료의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의 원리, 탈레스는 물이 그런 원리라고 했다, 983b20에 얘기가 있다. 그리고 《영혼론》의 1.5, 411a에 "모든 것들은 신들로 가득하다",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화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해 보겠다.
탈레스는 질료의 물이 모든 것의 원리arkhē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신들로 가득하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원리, arkhē, 시초다. 이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물이 모든 것이 시초다고 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arkhē이니까 출발점이다. 그것이 관철되어서 하나의 원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물은 시초이고, 그 시초가 움직여가는 게 원리이다. 즉 arkhē가 있고 그다음에 이 arkhē에서 발원해서 arkhē에서 시작되어서 그것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기율하는 하나의 질서가 prinzip이다. 시초arkhē와 원리prinzip를 묶어서 시원始原(Anfang)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희랍 철학에서는 arkhē 안에 원리도 들어있다고 본다. 그래서 시초이자 원리, 그래서 물을 Anfang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에서 하느님은 모든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했으니까 하느님이 시초이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세계가 움직여 가니까 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느님은 시원始原(Anfang)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탈레스는 질료인 물이 모든 것의 원리라고 천명했다. 그러면 그러므로 물에서 시작해서 그 물이 어떤 형태로든 변형이 되건 아니면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건 간에 물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만물 안에 다 스며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원리라고 생각했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있는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element이다. element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가리킬 수 있다. 따라서 《영혼론》에 있는 말인 "모든 것은 신들로 차 있다"라고 말하면 모든 것everything에 물이 가득 차 있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원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모든 것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할 때,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혔을 때 이것을 화해시키는 방법은 '물이 신이구나'라고 해버리면 아주 쉽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해서 말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을 신들로 가득하다"라는 이 말은 "영혼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라는 의견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영혼과 물이 동일한 것은 아닌데,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으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 움직여가게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생각도 그렇고 자연철학자들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 라는 것과 그 신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탈레스가 그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다고 전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아스토텔레스는 자기가 모르는 거는 기록을 안 했겠지만 말을 왜곡해서 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탈레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혼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 라는 이 의견은 사실 탈레스가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모든 것은 신들로 가득하다 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사실 철학과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운다. 모든 것은 신들로 가득하다. 여기서 신은 물이 아니라 놀라운 것, 인간의 힘을 넘어선 것 이런 식으로 배운다. 그러면 인간의 힘을 넘어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적 에너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자연적 에너지라고 해석을 하면, 이제 조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John Burnet의 《Early Greek Philosophy》에 나와 있는 나와 있는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체로 그렇게 해야 자연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자연 철학자들에 대한 해석이 일관성 있게 된다. 자연철학자들은 자연 안에 있는 어떤 위대한 에너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자연 철학자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놓고 그 대전제에 따라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신들을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다르게 말하면 초월적인 어떤 것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Burnet의 해석은 철저하게 자연 철학으로서의 자연 철학을 존중하는 그런 해석인데, 또 다른 해석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연을 넘어선 어떤 힘,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게 자연 철학이 아니게 되어버린다. 자연 철학은 자연에서 시작해서 자연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석의 일관성을 못 갖게 된다. 그러면 그들을 자연 자연 철학자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세계 영혼world-soul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 여기다 넣어버리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질송도 지적하고 있듯이 "후대의 재구성"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세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도출해 내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본다고 하면 스토아주의의 섭리처럼 가는 것이다. 그게 키케로의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1.25에 나온다.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원질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는 또 물로부터 만물을 조성해 낸 저 영혼이 신이라고도 했습니다." 물이 만물의 원이라 여기 원질이라고 하는 게 원리라는 말을 강대진 박사는 원질이라고 번역했는데 라티움어로 principium이겠다. "물로부터 만물을 조성해 낸 저 영혼이 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니다. 왜냐하면 물이 만물의 원질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시초arkhē이다. 모든 것의 원리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거기 "물로부터 만물을 조성해 낸"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러면 물이 시초가 되고 그다음에 만물로까지 가는 원리prinzip이 영혼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신이다. 이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키케로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겠는가 싶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물은 있는데 그 물이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만물을 조성해내는 게 아니라, 물은 영혼, 즉 신이 창출해낸 건 아니고 물은 주어져 있다. 물은 주어져 있는데 그 물을 만물로까지 끌고 가는 게 영혼psykhē이고, spiritus, 그 영혼이 신이다 그러면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이제 우주의 이치다. 영혼은 이제 초자연적인 것이고, 자연 철학을 넘어가버린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과장이다.
키케로가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탈레스가 한 말인 "모든 것은 신들로 가득하다"와 "철학의 시조 탈레스는 물이 그런 원리라고 천명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묶어서 세계 영혼이라는 개념을, 키케로 스스로 창출한 개념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재구성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 철학의 영역에서 trans-naturalistic philosophy로 끄집어 올린 후대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는 탈레스에 대한 후대의 재구성이고 있는 그대로의 해석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각주 3번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세계의 영혼을 탈레스의 것으로까지 귀속시키는 태도들이 있다. 질송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뢰할 만한 역사적 증거는 없다. 이건 문헌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일단 키케로의 이 얘기는 적절하게 해석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철학적 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뢰할 만한 역사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구성을 했다고 보겠다.
그러면 일단 키케로의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의 문제는 이쯤 정리를 해두고, 문제는 물이 모든 것의 원리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에 이 원리가 관철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 두 개의 것을 화해를 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게는 물과 신성divinity를 동일시한다. 다시 말해서 물을 최고 신으로서의 물, 물이 supreme deity라고 말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탈레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에서 비롯된 제멋대로의 자의적인 동일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석은 기각되고, 두 번째는 Burnet의 해석이다. "신들로 가득하다"라는 언명에서 "신들"이라고 하는 말을 물로 간주하는 것, 즉 신들을 물로 보는 것이다. 앞에 있는 물과 신성을 동시에 하는 것과 좀 다르다. 물을 신성과 동일시하는 것이나 신들을 물로 간주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신들이라고 하는 말은 물이라고 하는 말을 쓸 자리에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의미하는 바의 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물water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 해석인 물과 신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물을 water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성한 무엇인가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 해석은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순전히 자연적인, physical하고도natural 에너지인 물과 같은 것을 의미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게 John Burnet의 《Early Greek Philosophy》의 해석이다. 《Early Greek Philosophy》는 지금은 고전으로 읽지 않는다. 참고 문헌들이 왜 이렇게 100년 전 것을 쓰고 있는가. 질송이 이 강연을 한 시기를 생각해야 된다. 그 철학 책들은 이렇게 100년 전의 것들이라 해도 한 번 쯤은 검토하고 지나갈 만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Early Greek Philosophy》이다. 지금 이천년 대에 철학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배운 게 1980년대 중반이니까 그때만 해도 아주 오래된 책은 아니었다. John Burnet은 이오니아의 자연 철학자들에게는 신학적 사변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다. 합리주의적 해석rationalistic interpretation인데, Burnet의 대전제는 정말 말 그대로 자연 철학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다.
아낙시만드로스의 apeiron, 무한정자無限定者, 번역자는 무규정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규정자가 틀린 말 아니다. 그다음에 아낙시메네스가 말하는 공기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탈레스가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연의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런데 Burnet처럼 합리주의적 해석을 한다는 것을 일단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과학이라고 하는 태도를 철학이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신화에서 과학을 도출하지 않는다. 신화에서 과학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신화들을 읽으면서 그것에서 그들이 과학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이다. 오늘날의 과학적인 태도로 읽으면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신화라고 하는 것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의 구별이 엄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과학적인 언명을 했다 할 때 그것이 온전히 과학적으로, 오늘날 말하는 의미에서의 과학 방식으로 언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분명히 신화적인 내용들 또는 조금 더 하자면 종교적인 내용들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까지는 제거를 하면 안 되는데 완전히 제거해서 Burnet는 합리주의적 해석을 제시했다. 이 경우에 rationalistic interpretation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근대 이후 과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것에 합당치 않고 그것과 충돌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소거해 나가면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합리주의적 해석이다. 합리주의적이라고 하는 말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Burnet의 경우에는 합리주의라고 하는 말이 정말 1번 뜻으로 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합리적 해석을 제시한다면 아주 깔끔하긴 한다. 플라톤은 거의 읽을 게 없는 것이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mythos스를 도입해야 하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안 읽어도, 쳐내기 시작하면 플라톤의 책에서 읽을 게 남아있지 않다. 탈레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탈레스뿐만 아니라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아낙시만드로스나 아낙시메네스나 이런 사람들의 텍스트를 모두 다 읽을 필요가 없게 된다. 신이라는 술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 해석의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할 필요가 없다. 문제를 해소해 버리는 것이다. 이오니아 철학자들에게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말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무조건 '신 = 자연의 에너지' 이런 식으로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오니아 자연 철학에 대해서는 이른바 탈신화 해석이 타당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눈앞에 놓여 있는 자연 세계를 탐구했고 자연 세계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근본 원리를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보았고, 어떤 사람은 지수화풍, 그래서 바람에 해당하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져 두면 이오니아 자연 철학에 대해서 일관된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시켜서 얘기했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모든 의식적인 것까지도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시켜서 설명을 하게 되면, 정신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힘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오니아 자연 철학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들하고 호메로스의 서사시나 플라톤의 대화편 이런 것들과의 연결고리는 전혀 마련되지 않는 셈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이오니아 철학자들과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연속성이 없는 완전한 단절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간단치 않다는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헬라스 철학이 후대에 남겨준 신 개념의 원천이다 라는 주장이 있다. 지금 질송 같은 경우도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 분명히 인격적인 의미에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스 철학에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것부터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 질송이 preface에서 자기가 강연하는 방식으로 일단 철학사에 등장했던 데이터들을 놓고 검토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determine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이다. 그 단계에서 헬라스 철학을 검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헬라스 철학과 기독교의 신이 무슨 의미가 관계가 있는가 하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버리면 검토할 이유가 없다. 그건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다. 헬라스 철학이 후대에 남겨준 신 개념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이 테제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질송은 이제 철학사의 다른 데이터들을 살펴보는데 그것이 historical hypothesis이다. 역사적 가설historical hypothesis을 하나 세우는데, 역사적 가설이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고대 헬라스에서 사용되던 신들이라고 하는 용례들을 검토해 보고 있다.
즉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 본성, 역할의 용례를 살펴본다. 첫 번째가 불멸자이다. 서사시를 읽어보면 항상 불멸하는 신들, 죽을 운명의 인간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과 연결돼서 필멸하는 인간 그렇게 얘기된다. 불멸자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철학적인 것은 아닌데, 호메로스의 경우를 보면 "사람이라고 부를 법한 것",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물리적 실제이다. 바다, 강을 지배하는 자들이고 그 신들이 유한한 생명을 관할하는 자연적 운명이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존재자들 그리고 사물 그리고 추상적 개념, 운명 이런 것은 추상적 개념이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질송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공통점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지닌 살아있는 힘living power이다. living power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 살아있는 힘, 즉 생명이다. 인간은 살아있는 힘이 아니다. 인간은 필멸자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소멸하지만 신들은 living power라고 하는 속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신화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철학 후대에 말하자면 신개념으로 흘러가는 원천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생명력들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얘기를 《일리아스》에서 한다. 이런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들이 가진 생명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각주 8번을 보면 "모든 그리스 비극처럼 모든 그리스의 시는 시와 비극의 완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후 세계의 서막(Prelude in Heaven)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질송이 책으로 내면서 덧붙여놓은 게 아닐까 싶은데, 각주 8에 붙어 있는 본문의 내용은 《일리아스》에서 아가멤논이 자기가 한 일의 실제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한다. "내가 아니라 제우스가 원인이다. 그리고 모임에서 내가, 심지어 내가 아킬레우스에게서 포상을 빼앗을 때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나의 영혼을 잔인한 광기 속으로 집어넣은 에리니스가 원인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모든 일을 이루는 이는 신이다."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세계에서만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힘은 거의 없다. 비극에서도 그렇다. 아이스퀼로스를 봐도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은 신이다. 인간의 주체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도 전혀 없고 아이스퀼로스 비극 단계에 와도 없다. 에우리피데스에 오면, 메데이아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deus ex machina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나서서 뭔가를 해치워버린다. 에우리피디에스가 비극을 망쳤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어떤 그런 해석이라기보다는 니체의 견해이다. 일단 여기 아가멤론의 이 얘기는 신들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는 말이다. 호메로스부터 아이스퀼로스까지는 아직도 그것이 관찰되고 있는데, 소포클레스에 오면 속된 말로 신들에게 반항하는 오이디푸스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다가 에우리피데스에 오면 신들은 말 그대로 deus ex machina, 기계로부터 온 신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못하고 주인공들이 주체적인 결단들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주체적인 결단 그런 측면들을 강조해 내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니체처럼 기존에 에우리피데스가 모든 드라마를 망쳤고 엉망으로 만들어서 에우리피데스에 오면 지리멸렬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부르노 스넬의 《정신의 발견》에서 그런 해석을 내놓는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에우리피데스에서 망가진 게 아니라 인간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에우리피데스는 근대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각주 8번에서 아가멤논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을 신으로 돌렸는데, 거기까지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질송이 "모든 그리스 비극처럼 모든 그리스의 시는 시와 비극의 완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후 세계의 서막(Prelude in Heaven)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 Prelude in Heaven는 일반적으로 "천상의 서곡"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나온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Prolog im Himmel이 나온다. 이건 괴테의 창작이 아니라, "천상의 서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세계가 아니라, 지상의 반대말이 천상이니까. 지상 세계가 아닌 천상. 초월적인 세계의 서곡, 괴테의 《파우스트》의 천상의 서곡 부분을 보면, 《욥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천상에서 신과 사탄이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늘에서 설계한다는 의미에서의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서곡에다 놓는다는 말이다. 즉 지상의 모든 것들은 천상에서의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바로 이게 아가멤논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모든 일을 이루는 이는 신이다."라고 말은 《파우스트》에 나오는 천상의 서곡에 근거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아가멤논의 이 얘기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끝난 게 아니라 괴테 《파우스트》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괴테 《파우스트》는 근대의 서사시라고 「문학 고전 강의」에서도 규정을 했는데, 그것이 호메로스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 바로 Prolog im Himmel의 공통점이 있다, 신들이 모든 것의 진정한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Prelude in Heaven이라는 말을 넣었다. 신들이 바로 세계의 진정한 주권자, 주권자라는 말보다는 주재자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겠다. 그러니까 질송 정도 되는 사람의 책을 읽을 때는 고전 텍스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새삼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개념적으로 호메로스가 생각을 했을까는 조금 의문이다. 괴테처럼, 적어도 괴테는 《욥기》를 읽었을 테니까, 천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천상에서 설계된 대로 움직여 간다 라는 그런 자각적 의식을 가지고, 서사시를 창작하는 것과 그냥 '이건 다 신의 뜻이지'라고 말하는 것과는 분명히 자기 의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래서 질송이 여기서 "상정"이라고 하는 말을 presuppose라는 말을 써놨는데,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미리 설정한다는 얘기이다. 거기까지 과연 갔을까 하는 건 의문의 여지가 좀 있다. "Prelude in Heaven" which gives the poem, or the tragedy, its full meaning. 그것에 완전한 의미를 부여하는, 완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아가멤논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가멤논은 왜 신의 탓을 돌리는가 그것은 바로 세계의 진정한 주재자가 신임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아가멤논은 어떻게 보면 비겁한 놈인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어찌 보면 아가멤논이 《일리아스》에서 세계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게 되면 Prelude in Heaven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아가멤논이야말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어쨌든 신들은 여기서 불멸자이고 그런 불멸하는 신들의 힘이 필멸하는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예를 들어서 뒤에 플라톤을 다룰 때도 그 부분이 나는데, 플라톤이 《법률》에서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얘기를 한다. 플라톤이야말로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전제하고 있는 세계관을 아주 충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러면 헬라스 세계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세계를 깨뜨려버린 사람은 에우리피데스겠다.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영역이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르노 스넬이 《정신의 발견》의 제6장 희랍비극에서 신화와 현실이 그런 해석인데, 신화와 현실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가 아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면 신들이 세계의 진정한 주재자라고 하는, 천상에서 벌어지는 서곡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려버린 사람은, 호메르스도 가령 이것을 자각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길게 말할 것 없이 에우리피데스가 된다. 그래서 에우리피데스를 둘러싼 해석에서도 아주 흥미 있는 논점을 만들어내는 것이겠다. 질송이 얘기한 것이 갑자기 에우리피데스와 연결이 되는 지점이 여기서 생긴다. 각주 하나를 따져보는 것 역시, 각주는 그냥 쓱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치밀하게 exēgēsis를 하면서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된다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천상의 서곡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연의 질서 안에서는 최고의 존재자인데 각각의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위력들이 있다. 그것에 연관된 위계가 있고, 가령 신들도 잠을 자지는 않을 수 없으니까 잠은 모든 신과 인간의 주인이고 그다음에 불멸하는 신과 인간 모두가 사로잡히는 사랑과 욕망,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일리아스》 16권 439~461행에 나오는 것처럼 제우스 자신의 의지이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 용례를 체크해 보고 나서, 역사적 가설들을 체크한 다음에 귀결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존재로 인식하는 또 다른 살아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필멸자의 세계를 자신의 의지로서 움직이는 불멸자가 신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의 자연 철학에서는 도대체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그런 해석이 여기서는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질송은 도출해 낸다. 헬레스에서 신이라는 개념은 종교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Early Greek Philosophy》와 같은 방식의 해석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각된다. 그다음에 이오니아의 자연 철학은 그냥 내버려 두면, 키케로의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그런 것처럼, 그것들이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 귀결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것이 유일하고 똑같은 신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갖다가 자연적 에너지로 보지 않고 세계 영혼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유물론적 범신론이나 스토아주의로 귀결된다.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가 마르크스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마르크스가 유물론자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서 마르크스가 데모크르테스는 필연적인 것을 얘기하고, 에피쿠로스는 Clinamen, 즉 미세한 차이, 우발적 차이 이런 걸 얘기했다 하더라도 데모크리토스나 에피쿠로스나 둘 다 유물론자인 건 틀림없다. 그 차이를 강조한다고 해서 에피쿠로스의 유물론적 성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두 사람 모두 다 세계의 궁극적 실체를 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이다. 범신론까지도 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운동에 있어서의 편차, 필연성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과 우발성을 용인하는 것과의 차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는 형이상학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걸로써 마르크스를 옹호할 수는 없다. 차라리 마르크스가 아주 심하게 헤겔적인 것에 경도되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을 논변해내는 것이 마르크스의 자발적 혁명운동론을 옹호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유물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오니아 자연 철학으로부터 논리적 귀결을 따라가면 그대로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는 어쩔 수 없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 그것을 세계 영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정신적인 것이 도출되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화해시키기가 어렵다. 자연철학적인 해석, 자연의 원리들로써 세계를 철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오니아 자연 철학인데, 그것을 특정한 인격들로써 세계를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즉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그것을 화해시키는 것이 어렵다. 자연의 원리로부터 철학 종교적인 것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자연적인 것만을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 종교적 함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란 무엇인가라고 이런 걸 물었을 때 데모크리토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답한 것은 단순히 세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고 그들은 유물론의 귀결에 이르는, 유물론적 범신론까지는 갈 수 있다, 그 귀결에 이르는 방법을 생각을 했지만 그것 이상의 것으로서의, 즉 관념론적인 설명은 다른 원천에서 길어 올려지는 것이다. 책 46~47페이지 부분은 바로 그런 설명인데, 희랍 사람들은 자연 철학적 설명과 함께 계속해서 헤시오도스처럼 종교적인 설명을 계속 유지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그리고 《철학 고전 강의》에서 헤시오도스를 거론을 한 이유는 헤시오도스의 설명이 자연 철학적인 설명과는 다른 원천인 것이고, 그 원천들이, 제가 형이상학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그것인데,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나오는 특정한 인격체들로서 세계를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것, 이런 것들이 형이상학의 역사에서는 자연 철학적인 전례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종교가 점진적으로 이성화되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 종교적인 설명에 있어서도 단절이 있는데,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형이상학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오늘은 어쨌든 역사적 가설과 탈레스에 대한 해석을 검토하고 그다음에는 질송이 플라톤 얘기를 시작한다. 책 48페이지 보면 "그리스 철학자 중 가장 위대한 이가 세계에 대한 종교적 해석과 철학적 해석을 화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은 못 해도, 그것이 몹시 힘든 일임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이 플라톤 얘기이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또는 신과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자연에 관해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런 관념론으로의 비약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검토를 다음 번에는 해보겠다.
'강의노트 > 책담화冊談話 2021-26'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담화冊談話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6) [7] (0) | 2024.05.10 |
|---|---|
| 책담화冊談話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5) [6] (0) | 2024.05.09 |
| 책담화冊談話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4) [5] (0) | 2024.05.08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9), God & Philosophy, Ch. 1 (0) | 2024.05.08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3-2 (0) | 2024.05.03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3-1 (0) | 2024.05.03 |
| 책담화冊談話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3) [4] (1) | 2024.05.01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7), God & Philosophy, preface (0) | 2024.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