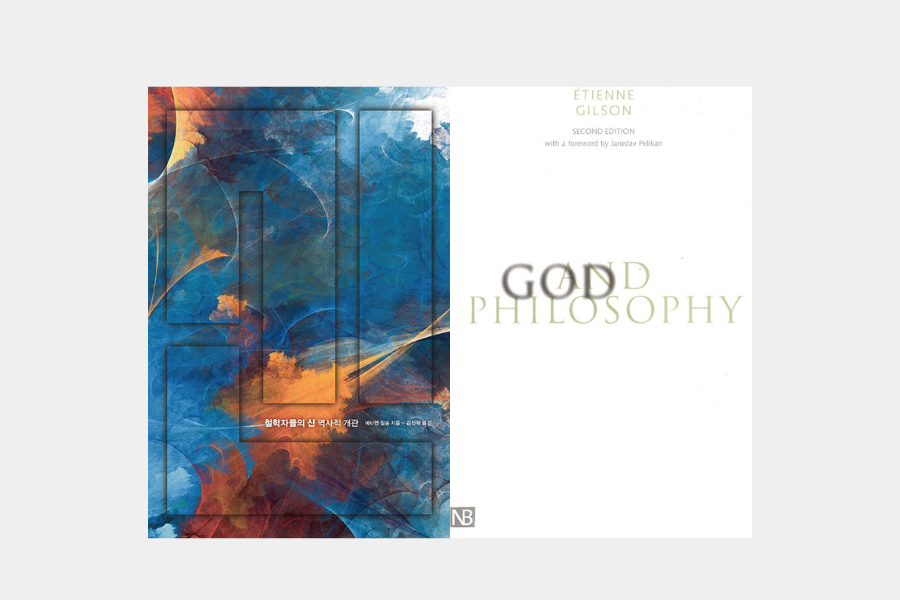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ε. Gilson, God & Philosophy」를 듣고 정리한다.
2024.05.14 ε. Gilson(11), God & Philosophy, Ch. 1
에티엔 질송, ⟪철학자들의 신 - 역사적 개관⟫(God and Philosophy, 2002)
텍스트: https://buymeacoffee.com/booklistalk/god-philosophy-ch-1
헬라스 철학에서 형이상학을 논의한다고 하면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 없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에서는 체계적인 완결은 없다. 열려있는 부분들이 있다. 인간과 신의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인간이 그저 이데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또는 이데아를 본받아서 세계를 창조하는, 우주를 만들어내는 dēmiourgos를 인간이 본받든가 아니면 인간이 철학자들처럼 직접적으로 eidos, 즉 이념이다, 플라톤은 이것을 설명의 원리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해 봐도 그것에다가 어떤 인격적인 창조력을 만들어 넣어 놓지는 않았으니까 설명의 원리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늘에 바쳐져 있는 설명의 원리로 본 것이고, 그렇다 해도 eidos와 dēmiourgos의 관계, 그리고 eidos와 인간의 관계 문제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eidos가 뭔가를 하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그것을 설명 원리로서의 제일 원리로서 제시를 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Lebendigkeit, 생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결된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무한자이고 절대적인 것이니까 그 어느 것도 그것에 침탈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니까 유한자를 매개로 해서 움직여 가지는 않는다. 유한자와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것이고 유한자가 그것을 향해 갈 뿐이고, 즉 유한자는 한없이 그것을 향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내려온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형이상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문이고 계속해서 탐구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질송은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은데, 유한자를 매개로 해서 스스로 운동해 가는 무한자라는 개념은 신플라톤주의자들에서 시작된 발상이고 그게 자칫 잘못하면 유한자의 신격화라고 하는 문제로 번져갈 수 있겠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주어진 사상 자원은 인간 자신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생동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인간은 자신의 영혼과 별들의 움직임이라는 두가지 원천에서 신 관념을 도출했습니다." 인간 자신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kinēsis, 운동이다. 생동성과 그다음에 별들의 움직임, 천체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 자신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건 생동성이고 별들의 움직임은 섭리겠다. 이 두 가지로부터 신 관념을 도출해서 철학의 철학의 제일 원인과 신개념을 결합했다. 철학의 제일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플라톤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데아이다. 이데아가 최고의 신이다. 그게 dēmiourgos하고 이데아의 관계에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연결고리가 없는데 그게 있다고 보아버린 것이다. 그러면 prime mover와 supreme god이 하나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prime mover로부터 제일 아래에 있는 미물에 이르기까지 잘 짜여진 필연적 우주에서 정점에 있는 신의 활동, 그 신의 활동은 noēsis인데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하위에는 동심원으로 된 천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존재의 대연쇄Great Chain of Being가 위계질서 속에 짜여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뭘 해야 되는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prime mover는 어찌 보면 생동성이 없다. 《형이상학》 12권 1074b34에 명료하게 나와 있다. "사유는, 만일 그것이 가장 좋은 것[to ariston]이라면, 자기 자신을 사유하고, [그러한 까닭에] 그 사유는 사유에 대한 사유이다." 사유에 대한 사유니까 자기 관조가 말하자면 신의 순수한 활동이다. 여기서 질송은 이런 얘기를 한다. "옛 신들이 관심사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이 관심사는 [원문에서는] picture인데, "사라졌다는 것은 철학만이 아니라 종교에서도 손실이 아니라 이득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읽으면서 이 부분에 빨간색 연필을 쳐놨는데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옛 신들이 사라졌다. 헬라스에서 계승받은 신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이득이었다. 철학에서는 명료하게 이득이다. 헬라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신들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신들을 움직이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신들도 물론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기는 하지만 신들은 제멋대로이다. 플라톤도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신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건국 신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한다. 일련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신들의 자의적 활동을 일종의 자연 신학적 체계 속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가능하게 된 것이고, 플라톤에서는 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옛 신들을 배제하고 일단 최상위에 선의 이데아를 놓고 그 선의 이데아를 본받아서 움직여가는 dēmiourgos와 같은 신들을 거기에 배치를 했다. 그러면 엣 신들이 관심사에서 사라진 것이고 그렇게 사라지게 함으로써 철학은 아주 질서정연한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처지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에 대한 이성적 체계 질서를 적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1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인간은 자신의 영혼과 별들의 움직임이라는 두가지 원천에서 신 관념을 도출했습니다.
《형이상학》 12.9; 1074b34 사유는, 만일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자기 자신을 사유하고, 그 사유는 사유에 대한 사유이다."
62 올림포스의 옛 신들이 관심사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철학만이 아니라 종교에서도 손실이 아니라 이득이었습니다. 신들에게 여전히 남겨진 진정한 위험은 그들의 신성 자체를 잃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종교에게는 왜 이득인가. 질송은 신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의 질서, 정연한 섭리 이런 것들을 철학에게 넘겨줌으로써 철학과는 무관하게, 이제 종교가 세계를 정당화하고 우주 질서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즘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말로 종교가 미신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활동에 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종교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우주론과는 관계없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말하자면 기복 종교로써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종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일이다. 헤시오도스에서는 그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질서로 나아가려는 것이 보이는데, 그 질서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되면, 종교 영역에서 질서를 빼버리면, 복을 빌고 철저하게 사람들과 밀착해서 그들과 그들의 삶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완전히 철학과 종교가 분리되어 버린 것이다. 형이상학으로서의 철학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상의 복을 가져다주는 종교가 분리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철학에서 섭리로서의 신을 가져갔으니까 그 신은 하늘에 있고 세상을 돌보는 것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이 할 일이 없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이나 《정치학》에서 실천적 앎pronēsis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 비극이 하는 일이 있겠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지점부터는 철학은 인간의 삶에 희노애락에 개입에 들어가지 않는다. 철학은 아주 차가운 섭리로서의, 차가운 이성의 법칙으로 정립된 신 그리고 그 신 아래에 동심원적 우주 그리고 그 아래 Great Chain of Being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철학은 자기가 자기 안에서 관조한다. 세상을 돌보는 것은 인간 자신의 일이 되었는데, 그 인간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철학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는 일상의 위로와 안심을 가져다주는 종교가, 온정적인 또는 일상에 밀착되어 있는 종교가 여기서 뭔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는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종교는, 아주 조금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골치아픈 이론적 작업을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사람들에게 기복 종교로서 은총kharis을 주고 그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뭘 받고 하는, 철학과 종교의 분업이 철저하게 일어나게 된다. 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은 이제 철학적 신이다, 세계는 하나이고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조화가 각 부분을 이루어 준다.
65 신 덕분에 세계는 하나입니다.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조화 혹은 공감이 부분들을 함께 엮어 줍니다.
그러나 이 신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없다. 안심을 주지 않는다. 질송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바로 이 부분들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일단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7권 9장에서 "모든 것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우주가 있고, 모든 것들에 내재하는 하나의 신이 있으며, 하나의 실체, 하나의 법률, 지성을 가진 모든 동물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이성 그리고 하나의 진리가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헬라스 철학이 발견해낸 신적인 우주이다. 이게 바로 헬라스 철학이 정립한 우주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것들에 내재해 있다"는 번역한 김재홍 박사가 [각주 18번에서] "dia pantōn은 문자적으로 '모든 것들에 침투하는'이다"라고 했다. 모든 것들이 스며들어가 있는 그런 우주를 설정했다. 그 신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철학의 업적인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신이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 세계에는 섭리가 있으나 인간에게는 어떠한 명령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이제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우주의 필연적 법칙을 상기하는 것이 전부이겠다. 우주의 필연적 법칙이 이렇다 하면 더 이상은 없다.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것들》 7.9 모든 것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우주가 있고, 모든 것들에 내재하는 하나의 신이 있으며, 하나의 실체, 하나의 법률, 지성을 가진 모든 동물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이성 그리고 하나의 진리가 있다.
그래서 질송은 이것에 대해서 쓰라린desperate 경험이라고 얘기한다. 질송은 스토아 철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각주 35번에서 그렇게 말한다. "even their good will does not inspire him whith any more cheerful feeling than an almost desperate resignation." 여기서 desperate resignation을 번역자는 절망에 가까운 체념이라고 했다. 이 신들은 절망에 가까운 체념 정도만을 주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대한 질송의 interpretation이 들어가 있는 건인데, 절망에 가까운 체념, desperate니까 절망에 가까운 이라기보다는 그냥 절망적인, 아주 처절한 처절한 체념, 처절한 체념만이 이제 남게 되는 것이다.
66 심지어 신들의 선의마저 그에게 절망에 가까운 체념 이상의 기운찬 감점을 유발하지 못합니다.
36 even their good will does not inspire him which any more cheerful feeling than an almost desperate resignation.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래서 "전체의 자연은 자기 충동에 의해 우주의 창조로 향했다. 그런데 현재 모든 사건은 그것의 자연적 결과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자연적 결과는 자연적 인과율, 필연적 연쇄, epakolouthēsis, 정말 무서운 말이다. 우주의 이치가 그러한 것, 인간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따라서 생겨난 것, 그렇게 해야만 우주는 이성적인 것이다.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로 일단 완결된 우주론, 형이상학에 대한 가장 차가운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질송이 얘기하는 것처럼, desperate resignation을 유도하는 텍스트이다. 그래서 사실 《명상록》을 읽고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다. 《명상록》은 고통스러울 때 읽으면 안 된다. 고통스러울 때 읽으면 그것이 더욱더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이니까. 우주는 자연의 자기 충동에 의해서 우주는 창조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연적 인과율epakolouthēsis이고, 그렇지 않으면 즉 자연적 인과율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았다면 모두가 다 이성적이지 않을 것이고, 우주의 지도적 이성이 자기 고유의 충동을 향하는 가장 중요한 일조차도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마저도 이성적이지 않다면 인간은 아수라장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셈이겠다. "많은 경우에 이 일을 상기하면 너도 더욱 평온해질 것이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인과율에 따라서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면 나는 왜 이렇게 평온하지 않은가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우주의 필연적 법칙을 상기한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 그런 절망, 체념resignation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것들》 7.75 전체의 자연은 자기 충동에 의해 우주의 창조로 향했다. 그런데 현재 모든 사건은 그것의 자연적 결과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다 이성적이지 않으며, 우주의 지도적 이성이 자기 고유의 충동을 향하는 가장 중요한 일조차도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이 일을 상기하면 너도 더욱 평온해질 것이다.
그래서 《명상록》은 "머지않아 너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너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잊혀진다.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한 radical pessimism이다. radical pessimism으로서의 행동 강령이고, 이건 행동 강령으로 nomos가 아니다. nomos가 아닌 수칙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철저한 이분법, 그런데 이게 desperate resignation을 한 사람이 그것까지 궁리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어떻게 해서 상기하는가, 플라톤에서 말하는 어떻게 상기하는가, 동굴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필연적 법칙을 상기하는 것은 필연적 법칙이 인간에게 뭔가를 알려줘서 상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상기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어떻게 상기하는가, 이건 《명상록》에서 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해 본 바에 따르면 플라톤적인 방법 외에는 제시된 바 없다. 《명상록》을 읽으면서 스토아 철학을 읽으면 그냥 철학의 절망이다. 철학은 그것 밖에 없는 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철학이 이제 과학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자연과학의 법칙이 이러하다고 하면 과학자들이 이러이러한 법칙을 내놓았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다. 거기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what you should do, 즉 해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히 value가 들어가는 것이다. 가치value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철학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답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만 읽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사실 제시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상기의 방법론까지는 안 나왔고 "머지않아 너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너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은 정말 radical pessimism이다.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 "A little while and thou wilt have forgotten everything, a little while and everything will have forgotten thee."라고 되어 있는데, 질송이 참조한 영역본에서는 "everything will have forgotten thee"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이 당신을 잊어버릴 것입니다"라고 번역을 해놓았다.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것들》 7.21 머지않아 너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너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66 "잠시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잠시면 모든 것이 당신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36 "A little while and thou wilt have forgotten everything, a little while and everything will have forgotten thee."
모든 사람이라기보다 모든 것, 모든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의 《명상록》 번역본은 everyone인데, 질송이 참조한 영역본에서 everyone이 아니라 everything이다. C. R. Haines의 1916년, Loeb Classical Library에서 나온 번역본인데, 질송이 참조한 것이 틀렸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도 우리에게 생각의 여지를 준다. 모든 것이 너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 맞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 전체에서 하나의 thing이니까 다른 thing들도 너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면 여기서 철학은 필연적 법칙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게 귀결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해가지고 마침내finally 이렇게 귀결이 되어버린다. 이제 인간은 그 법칙 앞에서 절망한다. 그리고 이것은 극단적인 철저한 급진적 급진적 염세주의pessimism이다.
그런데 이것을 질송은 종교의 상실로 이해한다. 질송이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다. 나중에 스토아주의 같은 것들이 이신론理神論의 맥락으로 흘러간다. 질송은 그런 건 종교라고 보지 않는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따뜻한 뭔가를 가져야만 한다 라는 게 질송의 신념처럼 보인다. 이것은 종교에 대한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세계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만들어내면서 종교를 잃어버렸다.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철학적 설명 all-comprehensive philosophical explanation of the world을 만들어내면서, 그런데 사실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연 신학의 진보, 질송의 이 말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포괄하면서도 그 정점에다가 신을 올려놓는 것이다. 우주 생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도 그것을 정점에 있는 신하고 연결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대우주론으로, all-comprehensive하면서도 필연적인 우주론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자연 신학인데, 그러려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최상위에 있는 prime mover와 같은 것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서로 다투고 있는 신들만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형이상학의 진보가 요구되었고, 첫 번째로 그것에 응답했던 플라톤 같은 경우는 설명의 원리로서 이데아 선의 이데아를 제시했지만 그것과 생동하는 신들 또는 생동하는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은 부족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체계로 만들었다. 질송은 형이상학은 종교의 영향 아래에서 그러한 진보를 이루어냈다 라고 말했다. curiously를 김진혁 교수는 희안하게도 라고 번역을 했는데, 김규영 선생님은 미묘하게 라고 번역했다. "make it under the influence of religion", 종교의 영향 아래서 그런 진보를 이루었다 라고 할 때 종교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는 질송의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진보를 이루었다, 종교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철학이 인간을 돌보는 일에서 벗어남으로써 그 일을 전적으로 어떤 종류의 것이든 어떤 종교이든 그 종교에게 떠넘김으로써 철학은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즉 "종교의 영향 아래"라고 하는 말을 종교를 의식하면서, 종교가 이런 것이니까 철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의식하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진보를 이루어내고, 그렇지만 이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즉 육체sōma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는 철학이 아니고, 철저하게 종교가 가지고 있지 못하던 그런 측면들을 통해서 형이상학적 진보를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진 스토아 철학을 봐도 드러난다.
66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의 이러한 말은 그리스 지혜의 마지막 말이자, 종교를 상실하지 않고서는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철학적 설명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그리스인들의 실패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67 희안하게도 형이상학은 종교의 영향 아래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37 curiously enough, metaphysics was to make it under the influence of religion.
여기 에피쿠로스 얘기가 잠깐 들어가 있다. "신들의 완벽한 복락은 그들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특히 인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에서 신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 영원한 물질적 존재일 뿐입니다." "철학자들이 이성화한 신들에게는 수행해야 할 종교적 기능이 더는 없습니다." "그리스 신들은 철학자들 덕분에 지상의 일을 돌보는 것에서 자유로워지자, 이전에 가졌던 인간과 인간 운명에 관한 관심을 단번에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상실이다. 각주31에 에피쿠로스의 신 관념에 남아있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요소가 있다. 이는 그냥 각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철학은 지적인 고난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게 사실은 투명한 유리병 속에서의 고난이다. 인간과 인간 운명에 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철학이 가져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차가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질송이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돌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정도, 그 수준의 위안밖에 주지 못하는 것이고 따스한 위안은 더 이상 주지 못한다. 이게 헬라스 철학의 있어서 신 관념의 최종 귀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부터는 챕터 2를 읽겠다.
'강의노트 > 책담화冊談話 2021-26'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5-1 (2) | 2024.05.24 |
|---|---|
| 책담화冊談話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8) [9] (1) | 2024.05.22 |
| 책담화冊談話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7) [8] (0) | 2024.05.21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12), God & Philosophy, Ch. 2 (0) | 2024.05.20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10), God & Philosophy, Ch. 1 (0) | 2024.05.13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4-2 (0) | 2024.05.10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4-1 (0) | 2024.05.10 |
| 책담화冊談話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6) [7] (0) |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