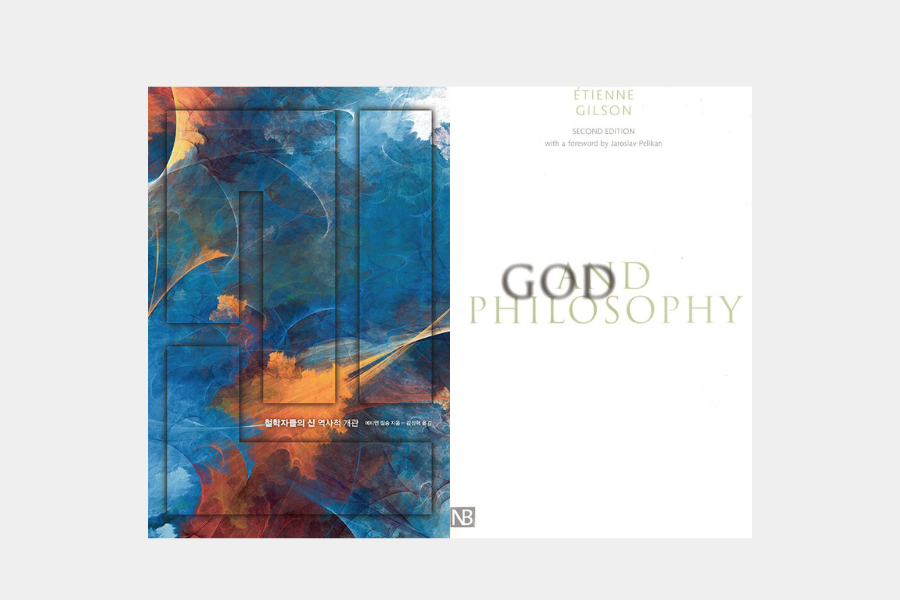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ε. Gilson, God & Philosophy」를 듣고 정리한다.
2024.06.22 ε. Gilson(18), God & Philosophy, Ch. 3
에티엔 질송, ⟪철학자들의 신 - 역사적 개관⟫(God and Philosophy, 2002)
텍스트: https://buymeacoffee.com/booklistalk/god-philosophy-ch-3
에티엔 질송의 이 lecture는 기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입장을 관철시키는, 다시 말해서 질송 고유의 견해를 철저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중세 기독교 철학Christian Philosophy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도 불완전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 신학을 포함한 형이상학의 절정이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절정이면 그 이후에 등장한 Modern Philosophy는 아주 당연하게도 질송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데카르트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간략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질송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주에 한 번 쉬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데카르트부터 다시 정리를 해서 해보겠다.
데카르트 철학에서는 중세적 이상이 붕괴했다. 최고의 학문으로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절대적 최고 원인인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세적 이상이 숙고하고, 그것이 세계에 관철되어 있고, 현전하는 세계의 모든 사물들이 신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논증해 보여야 하는데, 데카르트는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데카르트의 《성찰》에서 잘 나타난다. 사물에 대한 증명이라고 하면, 신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믿고 있지만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잘 정리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성의 빛만으로 진리를 찾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성의 빛의 궁극적 원천은 기독교의 신임으로 이 신의 성격을 변형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것이 근대 자연신학이 거쳐가는 경로 일반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데카르트의 신은 이성적인 순수성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신존재가 증명된다고 하는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에 그쳤다고 하는 것이 질송의 평가이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질송은 존재의 세계, 사물의 세계, 현전하는 세계 질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자연신학적으로 통합한 것이 형이상학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세부적인 텍스트 속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들은 헬라스의 형이상학적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상승하려는 인간 이성의 노고, 그것이 형이상학적 탐구이다. 완성될 수 없는, 더러 그 완성의 순간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인간이 그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쉴 수는 없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형이상학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본다. 데카르트에 대해서 질송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불만은 없다. 철학적 이해 가능성의 제1 원리로서의 신, 이신론, 그런데 이 신도 인격적인 신이라기보다는 이성의 원리 라고 이해한다 해도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형이상학의 본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서 데카르트는 철저하게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신과 철학적 이해 가능성의 제1 원리로서의 신을 구분한다. 그러다 보니까 파스칼의 《팡세》를 불러오게 된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신은 아브라함의 신이고 이삭의 신이고 야곱의 신인 파스칼의 신과는 다른 철학자의 신이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데카르트에서 했고, 그러면 데카르트 형이상학에 있어서 신과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보겠다.
데카르트에서 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앎에 있어 철저하게 그 모든 앎의 보증인이다.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 즉 이 세계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고 이 세계 역시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근본에서 놓여 있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 만든 세계이면서도 보통의 사물과는 다른 존재이니까, 세계를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니까, 세계를 창조한 신의 모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imago Dei로서의 인간, 데카르트 《성찰》의 제3 성찰에 나오는 얘기이다. 이 부분은 《철학 고전 강의》에서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그것을 참조하면 된다. 신의 모상으로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3 성찰에 있는가 하면 제6 성찰에는 정신과 신체의 합성체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규정도 등장한다. 즉 이 둘을 합하면 '이성적 부분을 가진 동물'로서의 인간, 이성적 부분은 신적인 부분이다, animal rationis particeps, 이성적 부분을 가진 동물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규정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부분이 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신체라고 하는 것을 안다 하면 그것을 신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순간이 바로 인간이 유한함을 자각하는 순간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부분은 신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성적 부분을 내가 발휘해서, 이용해서든 또는 활용해서든 간에, 이성적 부분으로서 나의 신체를 알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사물을 알려고 한다면 신이 나에게 뭔가를 허락해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의 은총만이 인간에게 앎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얘기이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앎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또는 세계의 사물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려는 순간, 인간은 동시에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바로 그 유한함을 자각하는 것이 곧 무한자에 대한 앎, 무한자를 알게 되는 어떤 occasion이 된다. 지금 occasion, 라티움어로 occasio라는 말을 썼는데, 데카르트에 이어지는 말브랑슈의 이론에서 흔히 기회원인론이라고 말하는, 그 기회원인론의 계기가 사실은 데카르트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데카르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세계의 사물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신이 창조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인간의 신체하고 세계의 사물들은 신이 자신의 법칙에 따라 만든 것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을 연장된 물체rex extensa라고 부른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가 이성적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신의 모상으로서 인간, 이 이성적 부분을 매개로 해서 신을 거쳐가는 것이다. 즉 내가 이성적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 순간,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성적 부분을 매개로 해서 신을 거쳐간다. 그러니까 의식이 올라가는 것이다. 도식적으로 그려보면 인간이 이성을 이용해서 곧바로 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을 우회해서 가야 된다는 것, 신을 비켜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신을 거쳐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주의이다. 지난번에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할 때 여러 차례 말했듯이 《고백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우리는 신의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주의이다. 그래서 데카르트에는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주의가 있다.
그렇다면 세계에 대한 나의 앎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것을 조금 도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occasio가 있어야 된다. 그때kaios,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있어야만, 그 계기가 있어야만, 기회라고 번역이 되는데, 저는 기회원인론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계기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라티움어로 occasio니까 영어로 옮기면 occasion도 되지만 moment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라는 말로 우리 말로 되게 번역이 되니까 그렇다. 지금 여기서 데카르트는 인간이 신의 모상으로서의 이성적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신을 거쳐서 세계를 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imago Dei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해도 신을 매개로 해야만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세계가 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니까, 아주 당연하게도 유신론이다. 신의 존재를 승인하는 태도이다. 신을 매개로 하지 않고 세계를 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무신론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 정신을 가지고 있다, 굳이 신을 거칠 필요 없고 곧바로 세계를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무신론의 기획이고, 그 무신론의 기획에서도 인간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위력, 힘, 그것을 거의 기존의 신과 같은 정도로 신과 맞먹는 정도로의 능력으로 상정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절대적 관념론이다. 절대적 관념론이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힘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세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태도,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말이다.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가 없다는 것이니까 그렇다. 지금 아직 여전히 데카르트는 신에 의존하고 있는데 데카르트가 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그리고 이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것이 17세기 서구인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취해낸다고 하는 것,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을 신적 입장으로까지 끌어올려서 전 세계에 대한 우주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고, 인간의 정신으로서 가질 수 있다고 천명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먼 길이다. 플라톤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헬라스 사람들도 굉장히 겸손하다. 헬라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신론자들이니까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
일단 정신이 움직여가는 것인데, 이것을 거꾸로 해보면 연장된 물체rex extensa가 내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다 또는 내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고 있다, 나의 신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occasio, 바로 그 kairos에 신이 나에게 관념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내가 의욕을 발휘할 때, 내가 행위할 때, 이것이 그냥 내 의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이 신이 개입하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계기원인론이다. 신이 무엇을 계기로 해서 나에게 신이 있다는 것을 각성시키는가, 바로 이 순간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은 모든 창조된 존재자들의 관념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 신은 모든 창조된 존재자들의 관념, 지금 여기서 관념이라고 했다, 존재자들은 그 존재자들의 본질과 그 존재자들의 존재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서 토마스주의를 얘기하면서 말한 바 있다. 신은 그 관념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은 자신 안에 관념은 우주 만물의 관념을 다 가지고 있다. 지금 비가 그치고 제 창 밖에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들이 녹색이었는데 벌써 6월말을 향해 가니까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아카시아 잎사귀가 녹색에서 짙은 노란색 그러다가 연노란색 그러다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색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데카르트주의자들은 신이 저 아카시아 나무에 뭔가를 작용을 했구나, 저 아카시아나무 잎사귀의 색깔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신이 있음을 알겠다 라고 생각한다. 아카시아나무 잎사귀 색깔의 변화를 아는 것은 그 안에 신이 저 아카시아 나무의 관념을 뭔가를 하고 있구나, 관념이라는 건 일종의 청사진blueprint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상 신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논변이다. 신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외부 사물에 대한 우리의 앎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선험적인 범주들로 규정해서 만들어진다.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고 확실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걸로 만족하자 라고 하면 칸트가 되는 것이다. 질송이 보기에는 그것이 현대 철학이다.
《철학의 원리》 1부 24항을 보면 신은 무한하지만 우리는 유한하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우리는 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피조물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피조물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다. 말 그대로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렇다. 신에게는 모든 존재자들의 관념이 있으니까 신을 아는 것은 존재자들의 관념을 아는 것이고, 존재자들의 관념은 청사진과 같은 것이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철학사 책에는 말브랑슈의 얘기라고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데카르트 얘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성찰》이나 《철학의 원리》를 보면 말브랑슈의 학설로서 알려진 계기원인론이 어설픈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완결된 형태로 있다. 그런데 계기원인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말브랑슈의 이론으로 이야기가 되는가. 말브랑슈는 이 계기 원인론을 가지고 세계의 사물들을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해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데카르트도 계기원인론을 가지고 있는데, 질송은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하게 전개해서 세계의 사물들에 대한 자연신학적 체계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물에 대한 우리의 앎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라는 선에서 그쳐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면 계기원인론이라고 하는 것의 완결된 형태인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데카르트는 계기원인론주의자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말브랑슈는 철저하게 계기원인론자이다. 세계는 신의 법칙으로서 조화를 이룬다. 이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말하면 존재자들의 관념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에 대한 신의 청사진, 존재자들의 관념 그런 것들일 텐데, 신의 법칙으로서 조화를 이룬다. 그렇다면 이 명제를 확장하게 되면 신은 법칙에 따른다 라는 명제로 전개가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얀센주의자들과 대립되는 지점이 있다. 그 당시 얀센주의자들은, 앙투앙 아르노Antoine Arnauld가 바로 파스칼이 있었던 포르로아얄 수도원쪽 사람인데, 신은 자유로운 의지의 발현이다. 신의 법칙으로 세계는 조화를 이룬다. 신은 법칙에 따른다 라고 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게 자연과학이다. 우리가 세계의 법칙을 안다는 것은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할 때 사용한 법칙을 안다는 것이고, 신이 세계를 작동시키는 법칙을 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바로 신에 대한 탐구가 되는 것이니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신론과 전혀 어긋나지 않는 지점이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의지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하면 코르넬리우스 얀센Cornelius Jansen이 창시했던 얀센주의자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앙투앙 아르노Antoine Arnauld와 같은 사람들의 얘기들에 가깝게 된다. 그런데 말브랑슈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말브랑슈는 철저하게 법칙으로서의 세계만 생각한다.
그렇다면 말브랑슈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질송이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물리학자이다. 법칙으로서의 세계를 얘기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물리학자가 된다. 데카르트가 제시한 기계론적 원리로서 세계의 사물들을 이해하는데 이때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정교한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기계론하고 목적론하고 부딪치지 않는다. 목적론은 세계의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향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여 간다 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주의자들이다. 일반적으로 목적론은 기계론과 충돌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세계의 목적은 신이 분명히 설정해 두었고, 세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은 철저하게 자연과학적 기계론, 기계론적인 법칙으로 세계를 작동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뭔가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이 정말 기계적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경로를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그의 목적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완벽한 메커니즘, 즉 기계론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계론과 목적론이 충돌하는 지점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말브랑슈의 신론에서 기계론적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물리적 인과율의 질서로서 움직이는 세계와 그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질서, 그 두 개 다 신에게서 기인하는 것이다. causal efficacy, 작용인으로서의 신, 모든 것의 원천으로서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의 원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지식의 질서는 사유이고 물리적 인과율의 질서는 사회 존재이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에서는 생각과 사물이 일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과 사물이 일치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앎의 보증인이 신이고 세계를 자신의 법칙에 따라 창조한 존재가 신이다. 앎이 생겨나게 하는 존재도 신이고, 앎의 작용인도 신이고, 세계 사물의 질서의 원인도 신이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앎의 원인이자 세계 사물의 원인, 운동의 원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두 개가 동일한 존재로부터 형성되어 나왔다고 하니까 인간은 앎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신이 인간의 앎의 보증인이다 라는 얘기부터 했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신이 앎의 보증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앎이 세계의 질서를, 인간이 정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을 때 세계의 질서를 모든 질서를 모든 관념을 모든 법칙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것 역시 사유와 존재가 동일한 질서를 서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된다. 사유의 질서를 다루는 학문이 논리학이고, 그리고 사물의 세계의 질서를 다룬 학문이 실제 철학real philosophy이다. 그렇다면 논리학과 실제 철학은 서로가 거울상speculum이 된다. speculum이라는 말에서 speculation이라는 말이 나왔다. 사변, 그렇게 보는 것을 사변 철학이라고 한다. 사변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신학자로서의 말브랑슈의 측면은 신은 자신에게 합당하게 활동한다. 합당하다는 것이 참 설명하기 곤란한 말인데, 법에 합당하게 진리에 합당하게 그런 말은 합당하다는 것이 내키는 대로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아르노라든가 얀센주의자들에 따르면 신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면 신은 분명히 제멋대로일 것 같지만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멋대로 해도 완전하다. 그런 것을 합당함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에서 적절함metrion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것은 아니다. kairos, 그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인데, 신은 어느 때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적절하다. 어느 때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적절하다 라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되며, 그것이 신의 합당함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신은 어떤 경우에도 합당하게 활동을 하고 동시에 완전한 앎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기원인론적 의미에서 존재자들의 모든 양적인 관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것이든, 아까 예를 들었던 아카시아 잎사귀가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때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계는 보편적이고 제일적uniformity이다. 지적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고 이는 신이 창조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브랑슈이다. 데카르트는 여기까지 안 나갔다. 물론 데카르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논변의 계기들은 충분하게 다 가지고 있었지만 질송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자연철학을 구상해내서 그것을 성취하지는 못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밀고 가면 라이프니츠가 된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로서의 신이 있고 그 신은 아무리 제멋대로 굴어도 최상의 가능 세계만을 창조할 수 있다. 신의 합당함 때문에 가능한 최상의 세계만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현전하는 세계는 최상의 것이다. 그래서 질송은 라이프니츠를 그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저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라이프니츠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 방식이라고 보는데,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의 신은 플라톤의 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는 이의가 있다. 플라톤의 선에 불과하다 라는 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자연신학은 아니다 라는 뜻인데, 플라톤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향해서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paradeigma로서 있는 것이지 선 그 자체가 인격신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질송은 라이프니츠나 말브랑슈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자연신학적 체계를 구상한다 해도 인격신으로서의 신,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까지 나아가지 않는 한 그것은 플라톤적인 의미에서 신에 불과하다, 플라톤주의자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신의 관념은 그리고 신의 본질essentia은 실존existentia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I'm이라고 하는 말만 해도 이미 있는 것이 되는, existentia를 포함하는데 완전한 존재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관념에는 실존이 결여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번 부수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제 이어지는 얘기는 스피노자이고, 스피노자 얘기를 하게 되면 라이프니츠가 얘기가 되는데, 스피노자는 철저하게 인격 신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스피노자는 기독교도가 아니고 유대교도도 아니었다. 라이프니츠도 자기 나름대로는 기독교적인 의미의 신을 얘기했겠지만 질송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저는 근대 철학을 썩 괜찮은 형이상학이라고 본다. 차라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신 개념을 폐기해버렸으면 운신의 폭이 넓었을 텐데, 질송이 보기에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신, 인격신의 개념을 철저하게 고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대 형이상학이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것은 형이상학의 개념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의노트 > 책담화冊談話 2021-26'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담화冊談話 | ε. Vindication of Tradition, Schumacher(2) (0) | 2024.08.16 |
|---|---|
| 책담화冊談話 | ε. Vindication of Tradition, Schumacher(1) (0) | 2024.08.13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20), God & Philosophy, Ch. 4 (2) | 2024.07.10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19), God & Philosophy, Ch. 3 (0) | 2024.07.08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8-2 (0) | 2024.06.17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8-1 (0) | 2024.06.17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17), God & Philosophy, Ch. 3 (1) | 2024.06.10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16), God & Philosophy, Ch. 2 (0) |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