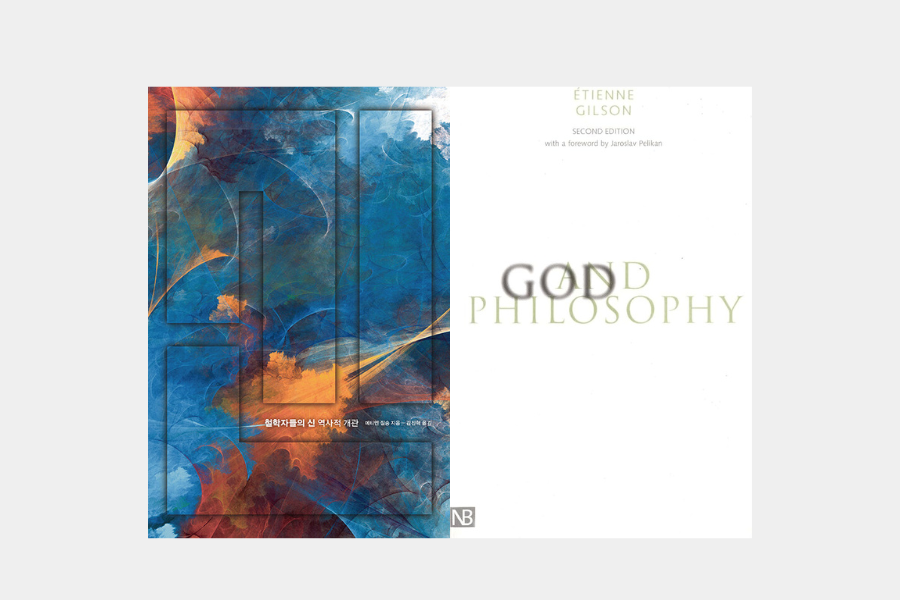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ε. Gilson, God & Philosophy」를 듣고 정리한다.
2024.07.02 ε. Gilson(19), God & Philosophy, Ch. 3
에티엔 질송, ⟪철학자들의 신 - 역사적 개관⟫(God and Philosophy, 2002)
텍스트: https://buymeacoffee.com/booklistalk/god-philosophy-ch-3
에티엔 질송의 신과 근대철학, 근대 철학에 있어서 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스피노자는 빼놓을 수가 없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백하게 신학자인데,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철학을 전개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크게 봐서 데카르트라든가 또는 파스칼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파스칼에 비하면 데카르트는 과학을 얘기하기 때문에 무신론적인 느낌이 있다. 그렇다해도 데카르트는 아주 명백하게, 비록 자신은 이단으로 몰릴까봐 그 당시에는 걱정했을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명백하게 유신론적인 신존재증명 얘기한다. 데카르트의 신존재증명은 그 계통이 안셀무스로부터 이어진다. 안셀무스로부터 이어지는 존재론적 신존재증명, 흔히 하는 말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신의 실존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existentia를 그 안에다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존재론적 신존재증명의 내용이다.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보면 신 얘기를 하는데 질송이 스피노자에 대해서 쓴 글을 보면 약간의 적대감을 느껴진다. 신존재증명을 한다고 하면서 신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아주 명백하게 기독교의 신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스피노자는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신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것을 꼭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순수한 철학자로서의 스피노자, 여기서 순수한 철학자라고 얘기하면 자연과학자라고 보면 된다.
133 그는 순수하게 철학자였습니다.
이성의 법칙을 따르는 또는 기하학의 질서에 따라서 신을 증명하는, 이성적 추론으로서 증명한다. 《에티카》의 제목처럼 기하학의 질서에 따라서 증명되고, 다음과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라티움어로 된 제목을 보면 Ethica, ordine geometrico demonstrata et in Quinque partes Distincta in quibus agitur. 《에티카》의 제1부가 신에 대하여이다. 그런데 이 신은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세계를 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자연이다. 그것 자체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자연, 필연성에 따라서 작동하는 자연을 스피노자는 신이라고 부를 뿐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신을 믿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렇지 라고 우리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기독교의 신은 아니다. 인격신은 아니고 그것 자체로 완결된 필연적 법칙을 가진 그리고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신, 그게 바로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신이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기하학의 질서에 따라서 신을 증명한다고 하면 세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신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굳이 신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간 자신도 자연이다. 그러면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정신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의 정신의 기원은 무엇인가. 자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자연 바깥에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정신은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감정, 한국어판 《에티카》는 정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서라기 보다는 감정, 인간 정신은 감정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성으로 나눌 수 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는 다르게 우주의 법칙 또는 자연의 법칙 또는 신의 법칙, 스피노자에서는 자연과 신은 똑같은 말이니까, 우주의 법칙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또는 실체인 신으로부터 기하학의 질서에 따라 연역되는 정신, 감정, 인간의 진성과 자유가 바로 《에티카》의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없다. 사실 스피노자의 신 얘기 안에서는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없다. 스피노자에서 신은 자기 원인causa sui이다. 자기 원인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서 비롯되고 자기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essentia이 곧바로 실존existentia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실존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은 본성상natura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Definitones 1번, 6번에서 얘기를 하고 Propositio 11번에서 정리해서 말한다.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신 또는 실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다. 신 또는 실체는,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가득 차 있다. 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도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신의 일부이다. 신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실존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본질이 이미 그 자체로 존재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실존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유일한 존재이고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실존하고 작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하며 신 없이는 실존할 수도 없고 파악될 수도 없다.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신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되겠다.
133 스피노자의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혹은 실체입니다. 그 신은 "본질이 실존을 포함"하기에 자기 원인입니다.
스피노자가 꼭 신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신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을 읽어보면 그렇다. 스피노자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은 17세기 유럽이다. 17세기 유럽에서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벌이는 온갖 나쁜 짓을 스피노자는 비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복을 주고 은총을 주는 신, 스피노자는 어떤 종류의 신을 믿는지는 관심 없고, 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벌이는 그런 싸움들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에티카》를 읽어보면서 대단한 신을 옹호하는 논변이라고 생각하기 쉽겠구나,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곧 보면 그냥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그것 자체로 필연적으로 꽉 짜여진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주다, 자연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어떠한 그 의지의 작용도 없다. 가령 정교하게 만들어진 어떤 기계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다. 처음에 동력을 부여받아서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기계는 그냥 작동한다. 그 기계의 제작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계한테 '기계야 너는 왜 움직이니'라고 물어보면 기계가 대답할 리가 없다. 설혹 그 기계가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움직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냥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이다. 그리고 그 신은 이 우주 전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신은 곧 자연, Deus sive natura는 4부 서론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신이라는 말이 나왔다 해서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없다.
134 신은 자연 자체입니다. Deus sive natura 신은 곧 자연.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한 그 기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라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가 기계이면 어떤 목적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스피노자가 왜 이런 신에 관한 논변을 만들어냈는가를 생각 해봐야 된다. 스피노자는 정말로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가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은 아니다. 이런 종류의 신에 관한 논변을 만들어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를 생각 해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스피노자가 이런 종류의 신존재증명 또는 신론을 내놓고서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했는가. 스피노자는 비판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혐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유대인 집단에서도 벗어났으니까, 스피노자의 눈에는 유대인이나 기독교도인이나 모두 다 똑같이 보였다. 그 사람들을 묶어서 스피노자는 목적론자들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읽을 때 황당무계한 픽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황당무계한 픽션을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그 당시 기독교도나 유대교도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개념을 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나쁜 짓을 비난하기 위해서 또는 비판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이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다. 스피노자의 《에티카》는 윤리학이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한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학문 영역이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떠한가를 먼저 얘기한다. 세상이 이러 이러하니까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세상은 철저하게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신이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신을 숭배하게 하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라고 하는 기독교도들의 얘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고, 그런 편견으로부터 선과 악, 공로와 죄, 칭찬과 비난, 질서와 혼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이런 것들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칭찬과 비난, 질서와 혼란,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가치 판단인데,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을 그들이 믿고 있는 신개념으로부터 이끌어내는데, 사실상 그들이 믿고 있는 신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의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스피노자 《에티카》 제1부 부록에 얘기가 있다. 사실 《에티카》를 읽을 때는 제1부 부록부터 읽어야 된다. 스피노자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되니까 그렇다.
질송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제1부의 부록을 얘기하면서 질송은 스피노자에 대해서 심하게 비난한다. 어쨌든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연은 자신에게 아무런 목적도 설정하지 않으며 모든 목적인은 인간의 상상일 뿐"이다. 중요한 말이다. 스피노자의 생각은 모든 목적인은 인간의 상상일 뿐이다. 인간이 뭔가 설명을 위해서 목적인을 전제하고 있을 뿐이지 그 목적인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도 얘기가 된다. 제1부 부록의 이 부분에 보면 이 말이 가장 스피노자가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다. 지붕 위의 돌이 머리에 떨어져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떨어졌다고 여기고 그것을 증명할 것인가. 아니다. 그냥 돌이 떨어진 것이다.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세계의 법칙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근거rationis는 구성imaginationis의 방법이다." 책에서는 상상력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표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사물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을 구축한 것이다. 이 근거는 표상의 외부에 있는 실체를 의미하는 듯한 이름을 가진다. 그게 일반적으로 신이다.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근거는 사실 우리의 상상력을 구축한 것인데 이 근거에다가 신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지탱해 주는 하나의 명백한 실체entia처럼 이름을 붙인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상상력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스피노자는 이성의 실체가 아니라 표상의 실체라고 말한다. 핵심은 《에티카》를 읽을 때는 제1부 부록부터 읽어야 된다. 제1부 부록의 내용 전체를 보면 질송은 목적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피노자가 《에티카》를 쓴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다. 인간이 신에 붙이는 이름은 이름일 뿐이고 인간의 명명과는 무관하게 신, 즉 자연은 자기원인적 필연성으로서 작동한다.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관계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질송은 스피노자가 말하는 입장에 서면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실정적 종교는 신인동형론적 미신anthropomorphic superstition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순수하게 이성적 필연성 또는 기하학적 필연성만을 가지고 세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무신론이라기보다는 기하학적 신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판단이 아닐까 싶다. 스피노자에 대한 질송의 설명을 질송이 조금 분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강연을 직접 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조금 경멸하는 정도로, 저는 질송이 과잉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135 그가 보기에 실정 종교들은 사람들이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낸 신인동형론적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플라톤은 '선'을 예배하는 정도로까지 가지 않았다. 플라톤에 있어서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성취되는가. 올바름dikaiosynē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의 원리이다. sophia 또는 phronēsis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thymos가 있어야 된다. 용기라고 불리는 것, 격정이라고 불리는 것, 분노로 표출될 수도 있고 뭔가 억제할 수 없는 힘, 그런 것들이 thymos이다. 그리고 그 thymos를 절제하는 것이 sōphrosynē, 그러니까 phronēsis 또는 sophia와 하고 thymos, sōphrosynē,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 harmonia의 상태에 이르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올바름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질송은 올바름을 예배하는 정도로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일종의 올바름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올바름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예배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질송은 예배worship라고 하는 말에다가 기독교적 종교를 꼭 덧붙여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질송은 신학자이고 아주 명백하게 토마스 아키나스주의자thomist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 못마땅하긴 하겠지만 플라톤 정도면 충분히 예배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종교는 자신이 변경할 수 없는 사물들의 질서를 그저 받아들인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긋이 바라볼 뿐이다. 《명상록》을 읽어보면 세상은 이러하다, 그러니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너 스스로를 보살피면 된다. 스피노자도 그렇지 않나 싶은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읽어보면 그저 받아들인 다음에 나대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데, 스피노자가 하는 것도 나대지 마라 정도 아닐까 싶은데, 질송은 그것을 자연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한다. 질송이 보기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스피노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저는 별 차이 없다고 보이는데 질송의 눈에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보면 유명한 구절들이 있다. 나대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하는 얘기들이 잔뜩 있다. 그런 것들을 스토아적인 고요함,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는 것, 그것은 일단 자연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을 하는 것이다.
135 플라톤은 선을 예배하는 정도로까지는 결코 안 갔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종교는 자신이 변경할 수 없는 사물들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자연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러하다 하면서 그냥 땡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것들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우주가 있고, 모든 것들에 내재하는 하나의 신이 있으며, 하나의 실체, 하나의 법률, 지성을 가진 모든 동물에게 공통된 하나의 이성, 그리고 하나의 진리가 있다." 7권 9장에 있는 내용이다. 이것은 스피노자의 얘기와 똑같다. 스피노자는 이것을 신은 곧 자연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일을 안 하는 것인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그 이상을 얘기했다. 8권 1장을 보면 "그럼 좋은 삶(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 내면의 자연이 추구하는 바를 행하는데 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룰까? 자신의 충동이나 행동의 원천으로서 몇 가지 원리들을 가짐으로써, 어떤 원리들인가? 좋음과 나쁨에 관한 것들로서 예를 들어 인간을 정의롭고, 절제하며, 용감하고, 자유롭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인간에게 좋은 것이 아니며 앞에서 말한 것들과 반대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인간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은 하지 말고 좋은 것을 해봐라 라고 한다. 그리고 또 "인간의 기쁨은 인간 고유의 일을 이루는 데 있다. 인간 고유의 일이란 동족에 대한 호의, 감각적 움직임에 대한 경멸, 믿을 만한 인상의 참 거짓 식별, 전체의 자연 및 이에 따라 생성되는 일들의 관조다." 굳이 신에게 예배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일이다. 저는 그래서 질송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사물들의 질서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저라는 말은 제가 덧붙여 놓은 것인데, 그저 받아들이는 것 말고 그 이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스피노자가 그 이상을 한다고 여긴 것은 망상과 오류, 악, 정신적 노예 상태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영적 자유와 분리될 수 없는 궁극의 인간 지복에 도달하고, 철학만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순수 형이상학적 답변이다. 질송은 이렇게 규정한다. 이것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예전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스피노자가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좀 읽어보니까 확실히 큰 계보들이 있다. 그래서 스피노자도 스토아주의 계열에 있다고 본다.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것들》 7.9 모든 것들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우주가 있고, 모든 것들에 내재하는 하나의 신이 있으며, 하나의 실체, 하나의 법률, 지성을 가진 모든 동물에게 공통된 하나의 이성, 그리고 하나의 진리가 있다.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것들》 8.1 그럼 좋은 삶(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 내면의 자연이 추구하는 바를 행하는데 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룰까? 자신의 충동이나 행동의 원천으로서 몇 가지 원리들을 가짐으로써, 어떤 원리들인가? 좋음과 나쁨에 관한 것들로서 예를 들어 인간을 정의롭고, 절제하며, 용감하고, 자유롭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인간에게 좋은 것이 아니며 앞에서 말한 것들과 반대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인간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것들》 8.26 인간의 기쁨은 인간 고유의 일을 이루는 데 있다. 인간 고유의 일이란 동족에 대한 호의, 감각적 움직임에 대한 경멸, 믿을 만한 인상의 참 거짓 식별, 전체의 자연 및 이에 따라 생성되는 일들의 관조다.
136 그는 망상과 오류, 악, 정신적 노예 상태에서 자신을 해방하였고, 영적 자유와 분리될 수 없는 궁극의 인간 지복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피노자의 종교를 가볍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철학만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100% 순수 형이상학적인 답변입니다.
그렇다면이 우주는, 이 자연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 간에 관계없는 몰교섭적인 수동적 보편성이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보면 스피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몰교섭적인 수동적 보편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우리 인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다시 말해서 신 또는 자연의 이성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지성을 개선해야 한다 라고 하는 요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 필연성을 전제하지 않고도 경건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으로 계속 작동하는구나, 제 멋대로이구나, 세상의 자유는 필연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랜덤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이 이렇게 랜덤하게 작동하고 개판인데, 나도 자연의 일부이니까 랜덤하고 개판으로 막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연은 비록 이렇게 개판이지만 나도 자연의 일부이긴 해도 내가 필연적인 법칙을 상상해서 그 필연적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겠다, 지성을 개선해야겠다 라고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결단 자체가 어이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랜덤하게 우연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랜덤하게 않게 살아갔다고 결심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연의 일부니까 인간도 랜덤하다. 그러면 사실 막 살아도 되는 것이다. 플라톤은 계속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지성을 개선하고 지혜를 가지고 thymos를 절제하면서 올바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우주가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스피노자는 우주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그냥 우주는 필연적인 것이다.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어김없는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의 일부인 이 존재도 그 필연성의 법칙을 내려받았다. 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스피노자에서는 인간이 막 살고 개판으로 살아도 그게 필연성인 것이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피노자는 우주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를 도출해낼 수는 없다. 스피노자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차라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우주는 이러하고 하나의 법률, 지성을 가진 모든 동물의 공통된 이성 그리고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하고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진리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맞는 얘기이고, 스피노자는 신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 인간이 그 신의 필연성의 일부인데, 그런데 굳이 지성의 개선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는 신의 필연성이 아니라 우연성을 얘기한다 해도 지성 개선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성을 개선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위의 영역이고 윤리학의 영역이고 신의 필연성이나 신의 우연성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의 영역이다. 사실의 영역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당위의 영역에서 뭔가를 결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기로는 키가 167cm밖에 되지 않으니까 187cm 되는 사람만큼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닐 수 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스피노자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답이 없다. 그래서 질송은 여기서 스피노자를 칭찬한다. 자신의 철학적 신화로 대체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실 스피노자의 지성개선론이라든가 신학정치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철학적 신화이다. 그리고 이것은 굳이 신에 대한 기하학적 논변이 없다 해도 가능한 것이고 아우렐리우스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36 그는 모든 실정 종교를 순전히 신화적이라고 폐기하고는, 그 자리를 자신의 철학적 신화로 대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질송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스피노자의 방식으로 스피노자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스피노자의 방식으로 스피노자를 극복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스피노자의 방식을 먼저 생각해 보면 신의 완전한 필연성을 제1 공리로 삼고 그것으로부터 세계의 완전한 필연성을 기하학적으로 연역해내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스피노자의 방식으로 스피노자를 극복한다는 것, 그냥 기하학적 필연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스피노자의 방식이다. 기하학적 필연성을 인정한다. "그의 한계를 한계로 이해한다." 그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신과 인간은 서로 관계가 없다. 그것이 스피노자의 한계이다. 유한자인 인간에게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몰교섭적인 수동적 보편성에 불과하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고, 신의 존재는 존재로서의 존재일 뿐이고 신 밖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활동으로 접촉한"다. 질송의 이 얘기는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야만 할 것 같다.
136 우리가 진정 스피노자의 방식으로 스피노자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의 한계를 한계로 이해함으로써 그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대 철학의 부분에서는 이제 질송이 마무리를 하면서 Deism, 즉 이신론에 관한 얘기를 한다. the myth which seems to have haunted so many mnds, 많은 사람이 정신을 홀린 신화라고 얘기하는데, 이신론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이신론은 변장한 무신론이다." 여기서 보쉬에가 말하는 무신론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신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스피노자도 이신론이다. 이성의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서 증명한 신인데, 기하학적 질서가 이성이다. 그것에 따라서 신을 증명했다면 이신론이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로 쓴다. 계몽주의 시대에의 시민종교를 가리킬 때 이신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신론이라는 말은 두 종류가 있다. 스피노자도 이신론자이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신론자이다. 신을 가져다가 이성적인 뭔가로 생각하는 것 또는 기하학적인 뭔가로 생각하는 것이 이신론이다. 그러니까 이신론자들은 계시된 신, 즉 계시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의 편견에 기인한 것이고 신의 우화적인 특징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는 스피노자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그렇고 스피노자도 이신론자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철학적 신화를 만들지는 않았다. 《에티카》에서 증명한 신을 숭배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공공영역에서 설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으세요 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의 이신론자들은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신이 궁극적 존재이고 실정종교의 신과 마찬가지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정의를 궁극적으로 실현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스피노자보다는 좀 나쁘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스피노자도 자기가 《에티카》와 같은 것을 쓰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무도 이것을 믿지 마세요, 그냥 나는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스피노자도 어쨌든 자기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자 했을테고,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읽고 필연성의 신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궁극적 존재이고 마찬가지로 권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정의를 궁극적으로 실현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만약에 생겨나서 스피노자 교를 만들어서 뭘 했을 수도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말이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집단적인 종교운동을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해서 스피노자와 구별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137 보쉬에는 "이신론은 변장한 무신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상을 다소 단순화한 진술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실정 종교들의 신에 관해서라면 맞는 진술이기도 합니다. 이신론자들은 소위 계시된 신의 우화적인 특징을 놓고서는 스피노자와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질송은 독실한 기독교도이니까 17,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순수한 자연 이성을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가져다가 종교일반이 가지는 성격을 거기다 붙였고 숭배 의식도 만든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겠다. 그 사람들의 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목적인에 관한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 세계는 거대한 기계이고 신은 이 거대한 기계를 다루는 시계 제작공이다. 그리고 이 세계가 거대한 시계, 거대한 정교한 기계이고, 신은 이 정교한 기계를 만들어서 작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작동시키는 신을 숭배하자 라고 얘기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플라톤이 말하는 데미우르고스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플라톤에서는 데미우르고스가 올바름을 실현하고자 하니까 그때그때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뉴턴적 질서 원리에 따라서 세계를 작용시킨다.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가 있는데, 그 데미우르고스가 뉴턴적인 작동 원리, 즉 기하학적 법칙에 따라서 세계를 작용시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근대철학 부분을 마치고 현대사상으로 들어가겠다. 현대 사상이라고 해봐야 칸트부터니까 우리로 치면 근대인데 서양 철학에서 굳이 현대라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대사상 두 번째 파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
'강의노트 > 책담화冊談話 2021-26'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담화冊談話 | 사회지리학 1-1 (0) | 2024.08.23 |
|---|---|
| 책담화冊談話 | ε. Vindication of Tradition, Schumacher(2) (0) | 2024.08.16 |
| 책담화冊談話 | ε. Vindication of Tradition, Schumacher(1) (0) | 2024.08.13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20), God & Philosophy, Ch. 4 (2) | 2024.07.10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18), God & Philosophy, Ch. 3 (0) | 2024.06.24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8-2 (0) | 2024.06.17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8-1 (0) | 2024.06.17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17), God & Philosophy, Ch. 3 (1) |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