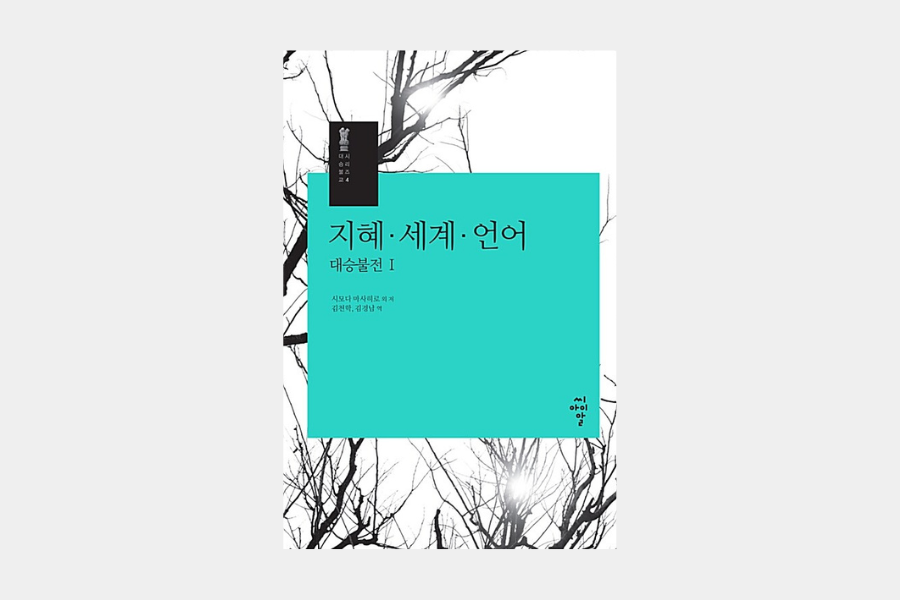
 |
지혜.세계.언어 -  시모다 마사히로 외 지음, 김천학.김경남 옮김/CIR(씨아이알) |
제1장 초기 대승경전의 새로운 이해를 위해-대승불교기원 재고 시모다 마하시로
제2장 반야경의 형성과 전개 와타나베 쇼고
제3장 반야경의 해석 세계 스즈키 겐타
제4장 『화엄경』 원전의 역사-산스크리트 사본 단편 연구의 의의 호리 신이치로
제5장 『화엄경』의 세계상-특히 성문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오타케 스스무
제6장 동아시아의 화엄세계 김천학
제7장 『법화경』의 탄생과 전개 오카다 유키히로
제8장 『법화경』의 중국적 전개 간노 히로시
제9장 『법화경』 수용의 일본적 전개 미노와 겐료
101 반야경은 최초로 대승(마하연)을 제창한 초기 대승경전의 선구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반야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바주르 사본이 기원후 1세기 전반에 서사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경전으로서의 성립은 기원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빈뱌경은 아마 부파불교 중에서도 깨달음을 추구하는 의식이 강한 수행승(보살)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들은 일체지자인 붓다의 지혜에 주목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를 새롭게 반야바라밀로서 제시하고, 그 지혜를 획득하기 위한 수행의 단계를 모색했다. 그것은 붓다에 이르는 길을 '붓다를 낳는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통적인 성자의 단계의 수행 체계를기초로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보살에서 붓다에 이르는 길을 지의 체계와 연결시키면서 불퇴전과 십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승의 수행 단계를 재구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반야바라밀경은 붓다의 깨달음을 가능하게 한 지혜를 현창하고 그 지혜에 입각해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경전이다. 대개 설법하는 붓타와 수브티 혹은 사리푸트라 등의 대론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대승보살이고, 찬동자를 선남자 선여인 혹은 좋은 사람(현자)이라고 한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부파의 교단에 속해있던 출가자를중심으로 해서 지지자들이 모인 그룹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114 우선 '법멸'에 관해서 보자. 법멸은 정법멸진이라고도 해서, 말그대로 바른 가르침이 멸하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불교에서 대승경전에까지 일관적으로 등장하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오직 불교도의 신앙태도와 관련해서 말한다. 말하자면 사중이 나태해서 삼보를 공경하지 않으면 정법이 멸하고 상법이 흥하지만, 삼보를 공경하고 따르면 정법이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초기 대승경전에서는, 붓다가 입멸하고 나서 500년이 지나 그 가르침(바른 가르침)이 소멸한다는, 불교의 존속을우려하는표현이다. 하지만 대승의 법멸사상에서는 정법이 소멸하는 때야말로 [새로운] 정법(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보살이 출현한다고 한다. 그 보살들은 지혜에 따라 선근을 쌓는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이 반야경전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야경전은 법멸사상과 대승불교의 확립을 밀접하게 관련지어 설명한다.
127 산푸리트어 프라즈냐는보통 반야, 피야, 발야 등으로그대로 음사한다. 그것은 번역하지 않는 다섯가지(다라니처럼 미묘하고 깊은 말, 여러가지 뜻이 있는 말, 중국에 없는 것, 예부터 소리나는 대로 써온 말, 번역하면 뜻이 가벼워지는 경우)라는 번역 규칙 가운데 '뜻이 가벼워지는 경우'에 따른 것이다. 즉, '반야는 깊고 중하지만 지혜는 가볍고 얇은 것과 같다'라고 한다. 또 반야라는 역어에 대해 '사람들이 공격하는 마음을 낳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말해 프라즈냐와 같이 심오한 의미를 갖는 말은 번역하면 원어의 깊은 뜻을 잃기 때문에 음역에 그친 것이다.
'책 밑줄긋기 > 책 2023-26'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레셰크 코와코프스키: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흐름 2 ─ 황금시대 (0) | 2025.05.18 |
|---|---|
| 스티븐 홀게이트: 헤겔의 『정신현상학』 입문 (0) | 2025.05.11 |
| 에밀리 S. 로젠버그: 하버드-C.H.베크 세계사 : 1870~1945 (1) | 2025.05.11 |
| 이사야 벌린: 카를 마르크스 (0) | 2025.05.11 |
| 존 스웨드: 마일즈 데이비스 (0) | 2025.04.28 |
| 샘 와인버그: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 (0) | 2025.04.28 |
|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정신현상학 2 (0) | 2025.04.20 |
|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정신현상학 1 (0)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