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담화冊談話 | 사통史通(34) ─ 史通, 外篇 - 史官建置
- 강의노트/책담화冊談話 2021-26
- 2025. 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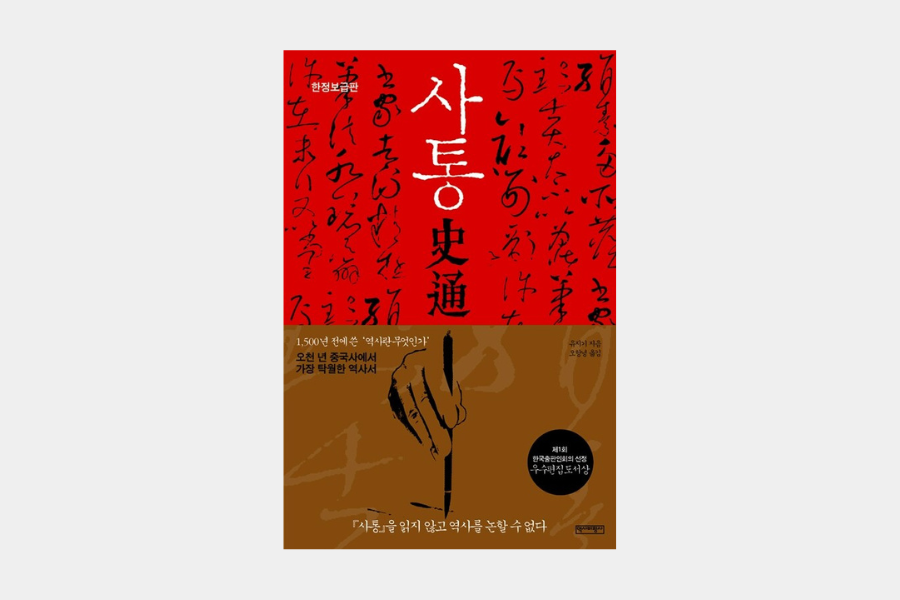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통史通」을 듣고 정리한다.
2025.07.05 δ. 사통史通(34) ─ 史通, 外篇 - 史官建置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shitong-10
사관건치史官建置 ─ 사관의 발달과 변화
• "··· 누구나 조바심을 내면서 공적이나 명성을 열심히 추구한다. 이는 왜인가? 불후의 사적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불후의 사적이라고 부르는가? 바로 역사서에 이름이 남는 일이다." (··· 기어공야명야其於功也名也 막불급급언자자언莫不汲汲焉孜孜焉 부여시자夫如是者 하재何哉 개이도불후지사야皆以圖不朽之事也 하자이칭불후호何者而稱不朽乎 개서명죽백이이蓋書名竹帛而已)
• "만약 세상에 역사서가 없고 당대에 기록을 맡는 사관이 없다면, ··· 그저 죽으면 한결같이 흙이 될 뿐이다. 그들의 무덤의 흙이 채 마르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가 구분되지 않고, 아름다운지 추한지도 모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관이 끊어지지 않고 역사서가 길이 남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아련히 사라지더라도 그의 행적은 살아 있는 듯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향사세무죽백向使世無竹帛 시궐사관時闕史官 ··· 단일종물화但一從物化 분토미건墳土未乾 이선악불분而善惡不分 연치영멸자의妍媸永滅者矣 구사관부절苟史官不絶 죽백장존竹帛長存 즉기인이망則其人已亡 묘성공적杳成空寂 이기사여재而其事如在 교동성한皎同星漢)
• "역사의 쓰임새는 그 이로움이 매우 넓으니, 바로 살아 있는 사람의 의무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도이다. 나라와 집안이 있는 경우에 어찌 이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사지위용史之爲用 기리심박其利甚博 내생인지급무乃生人之急務 위국가지요도爲國家之要道 유국유가자有國有家者 기가결지재其可缺之哉)
• 원래 역사의 길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당대 역사 자료를 통해 사실과 말을 기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리하고 산정하여 후대의 역사가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대의 기록을 처음 적는 사람은 널리 듣고 사실 기록에 의지해야 하니··· 후대에 편찬을 도모하는 사람은 탁월한 식견과 통달한 재능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니··· 굳이 일의 성격을 논하자면 전자와 후자가 같지 않지만, 서로 기다려야만 완성되므로 그 추구하는 바는 같다. (부위사지도夫爲史之道 기류유이其流有二 하자何者 서사기언書事記言 출자당시지간出自當時之簡 륵성산정勒成刪定 귀어후래지필歸於後來之筆 연즉당시초창자然則當時草創者 자호박문실록資乎博聞實錄 ··· 후래경시자後來經始者 귀어준식통재貴於雋識通才 ··· 필논기사업必論其事業 전후부동前後不同 연상수이성然相須而成 기귀일규其歸一揆)
유지기의 사통史通 내편內篇에 있는 내용을 몇 개 골라서 읽었다. 내편內篇와 외편外篇의 관계는 오항년 교수는 주主와 보補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내편內篇 안에도 구조가 있지만, 내편과 외편 사이에도 구조가 있고, 그것이 주─보의 관계일 것이다. 그래서 내편의 원론에 이어 외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실습을 수행했다고 말하는데, 100% 동의하기는 어렵다. 내편에도 사례라든가 실습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책은 굉장히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옛 고전들로부터 인용한, 약간 맥락 없이 이게 왜 인용이 되었을까 싶은 것들도 좀 있고, 그것에 더해서 자신이 모아놓은 자료들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주 중요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날 읽는 우리가 중국 당나라 때 만들어진 역사론으로부터 얼마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배울 게 사실 별로 없다. 그래도 읽어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널리 읽히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해낼 것인가,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번 주부터는 외편에 있는 내용들을 두서없이 골라서 좀 보겠다.
외편外篇의 첫 번째 챕터는 사관건치史官建置이다. 사관의 발달과 변화, 그러니까 중국은 관학의 성격이 있는데, 역사를 편찬하는 관청이나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얘기가 있다.
"인간이 천지 사이에서 모습을 갖추고 태어나 그 일생이 마치 하루살이가 이 세상을 살듯, 문틈으로 흰 망아지가 지나가는 것을 보듯 짧은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일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하루살이가 이 세상을 살듯', 그다음에 '문틈으로 흰 망아지가 지나가는 것을 보듯', 우리에게는 문틈으로 흰 망아지가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라고 하면 신기한 것을 본 것이라고 하는 비유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유지기에서는 그게 아니다. 신기한 것을 본 게 아니라 얼른 지나간다는 말이다. 문틈으로 본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면 된다. 2025년에 한국에서 세월이 금방 간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 문틈으로 흰 망아지가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태를 가져다가 해야 된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많이 봤겠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문틈으로 흰 망아지가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라는 표현이 《장자》 「지복」 편에 나온다고 한다. 장자는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다. 장자는 비유의 텍스트로 직설법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논어에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했을 때 배우고 때로 익히는데 뭐가 기쁩니까 몸만 상하지 라고 곧바로 읽자마자 반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장자는 일단 중국의 자연 환경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유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장자를 읽다 보면 과연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을지 굉장한 소구력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 21세기 한국에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먹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고전이 되었건 플라톤 시대의 서양 고전이 되었건 이런 데 나오는 비유는 굉장히 많은 것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읽어야만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낯설고 신기해 보인다고 해서 감탄할 일은 아니다. "나이가 되었는데도 공적을 세우지 못하면 부끄러워하고 종신토록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한다."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흔히 말하는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얼핏 든다.
"이는 위로 제왕에서부터 아래로 보통 사람들까지, 또 가깝게는 조정의 관리로부터 멀게는 산림에 묻혀 숨어 있는 사람까지, 누구나 조바심을 내면서 공적이나 명성을 열심히 추구한다." 산림에 묻혀 있는 사람까지 그럴까, 아닌 것 같다. 유지기는 "누구나"라고 했으니까 보편 언명으로 해서, 모든 사람은 그렇다고 했다. "누구나 조바심을 내면서 공적이나 명성을 열심히 추구한다." 기어공야명야其於功也名也 막불급급언자자언莫不汲汲焉孜孜焉, 급급汲汲하다는 분주하다는 말이고, 자자孜孜는 정신없이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왜인가? 불후의 사적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부여시자夫如是者 하재何哉 개이도불후지사야皆以圖不朽之事也. 이건 가슴에 와닿는 바가 있다. 인간이라고 하면 그렇겠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뭔가를 해야 역사에 이름이 남기지 않겠는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역사의 이름을 남기지 않더라도 기억되는 게 있겠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보다도 글로서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인 것 같다. "무엇을 불후의 사적이라고 부르는가? 바로 역사서에 이름이 남는 일이다." 하자이칭불후호何者而稱不朽乎 개서명죽백이이蓋書名竹帛而已, 불후不朽하다는 것, 썩지 않는 것은 무엇을 불후의 사적이라고 부르는가. 불후라 부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말이다. 역사서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죽백竹帛은 대나무와 비단, 역사책을 가리키는 말도 되고 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앞서 "종신토록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한다."라는 부분은 『논어』 「위령공」에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종신토록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괴로워한다."라고 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논어에서 공자님이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경우가 더러 있다. 논어 첫 구절에서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열받지 않으면 군자가 아닌가[인부지이불온人不知而不溫 불역군자호不亦君子乎] 라고 했는데, 그것이 일단 근본원리fundamental principle이다. 그런데 위령공衛靈公에서 "종신토록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괴로워한다" [자왈子曰 군자君子 질몰세이명불칭언疾沒世而名不稱焉]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 싶다.
그다음에 "만약 세상에 역사서가 없고 당대에 기록을 맡는 사관이 없다면, ··· 그저 죽으면 한결같이 흙이 될 뿐이다. 그들의 무덤의 흙이 채 마르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가 구분되지 않고, 아름다운지 추한지도 모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관이 끊어지지 않고 역사서가 길이 남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아련히 사라지더라도 그의 행적은 살아 있는 듯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향사세무죽백向使世無竹帛 시궐사관時闕史官, 만약 세상에 역사서가 없고 당대에 기록을 맡는 사관이 없다면, 단일종물화但一從物化, 그저 죽으면 한결같이 흙이 될 뿐이다.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다. 중간에 "요순 같은 성인도, 걸 같은 폭군도, 이윤이나 주공 같은 명신도, 왕망이나 동탁 같은 역신도, 백이나 유하혜 같은 깨끗한 사람도, 도척이나 장교 같은 도적도, 상신이나 흉노의 모돈 같은 친족 살인자도, 증삼이나 민자건 같은 덕망 있는 사람도 그저 죽으면 한결 같이 흙이 될 뿐이다." 이런 말이 있다. 증삼이나 민자건 공자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왕망을 역신이라고 봤는데 다르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다. 흙이 된다 라고 하는 게 표현이 단일종물화但一從物化, 사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본다. 물物이라고 하는 게 마르크스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인간이 생산 관계 속에서 물질화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한낱 자연물이라는 뜻이겠다. 불교나 또는 도가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기록하는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물物에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자연물과 하나가 되어서 또는 불교는 아예 하나도 아니다. 모든 게 다 무상한 것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물화되고 만다 라고 하는 말에서, 유가는 물화를 경계하는 것이다. 물화를 경계하려면 역사의 이름을 넣어야 되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것에서도, 그러니까 군자는 종신토록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괴로워한다 라는 것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분토미건墳土未乾 이선악불분而善惡不分 연치영멸자의妍媸永滅者矣, 그들의 무덤의 흙이 채 마르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가 구분되지 않고, 아름다운지 추한지도 모르게 될 것이다. 구사관부절苟史官不絶 죽백장존竹帛長存 즉기인이망則其人已亡 묘성공적杳成空寂 이기사여재而其事如在 교동성한皎同星漢, 하지만 사관이 끊어지지 않고 역사서가 길이 남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아련히 사라지더라도 그의 행적은 살아 있는 듯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이겠다.
그다음에 "역사의 쓰임새는 그 이로움이 매우 넓으니, 바로 살아 있는 사람의 의무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도이다. 나라와 집안이 있는 경우에 어찌 이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사지위용史之爲用 기리심박其利甚博, 역사의 쓰임새는 매우 넓으니, 심甚은 깊을 심甚자인데, 깊고 넓으니 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 매우라고 부사어로 해석을 해도 되고, 심오하다고 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오항녕 교수는 강조하는 것으로 했다. 내생인지급무乃生人之急務 위국가지요도爲國家之要道, 바로 살아 있는 사람의 의무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도이다. 유국유가자有國有家者 기가결지재其可缺之哉, 나라와 집안이 있는 경우에 어찌 이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맨 마지막에 보면 역사의 길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원래 역사의 길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당대 역사 자료를 통해 사실과 말을 기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리하고 산정하여 후대의 역사가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대의 기록을 처음 적는 사람은 널리 듣고 사실 기록에 의지해야 하니··· 후대에 편찬을 도모하는 사람은 탁월한 식견과 통달한 재능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니··· 굳이 일의 성격을 논하자면 전자와 후자가 같지 않지만, 서로 기다려야만 완성되므로 그 추구하는 바는 같다." 부위사지도夫爲史之道 기류유이其流有二, 역사의 길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서사기언書事記言 출자당시지간出自當時之簡 륵성산정勒成刪定 귀어후래지필歸於後來之筆, 하나는 당대 역사 자료를 통해 사실과 말을 기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리하고 산정하여 후대의 역사가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즉당시초창자然則當時草創者 자호박문실록資乎博聞實錄, 따라서 당대의 기록을 처음 적는 사람은 널리 듣고 사실 기록에 의지해야 하니, 후래경시자後來經始者 귀어준식통재貴於雋識通才, 후대에 편찬을 도모하는 사람은 탁월한 식견과 통달한 재능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니, 필논기사업必論其事業 전후부동前後不同 연상수이성然相須而成 기귀일규其歸一揆, 굳이 일의 성격을 논하자면 전자와 후자가 같지 않지만, 서로 기다려야만 완성되므로 그 추구하는 바는 같다.
'강의노트 > 책담화冊談話 2021-26'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담화冊談話 |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4) ─ 春秋 (1) | 2025.08.04 |
|---|---|
| 책담화冊談話 |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3) ─ 尙書 (0) | 2025.07.27 |
| 책담화冊談話 |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2) ─ 尙書 (1) | 2025.07.21 |
| 책담화冊談話 |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 ─ 緖 (1) | 2025.07.16 |
| 책담화冊談話 | 사통史通(33) ─ 史通, 內篇 - 覈才, 辨職 (2) | 2025.06.29 |
| 책담화冊談話 | 옥스퍼드 세계사 20-2 ─ 제4부 제10장. 근대 초 세계의 군주, 상인, 용병, 이주민(2) (4) | 2025.06.26 |
| 책담화冊談話 | 옥스퍼드 세계사 20-1 ─ 제4부 제10장. 근대 초 세계의 군주, 상인, 용병, 이주민(2) (0) | 2025.06.26 |
| 책담화冊談話 | 사통史通(32) ─ 史通, 內篇 - 書事 (1) | 2025.06.22 |